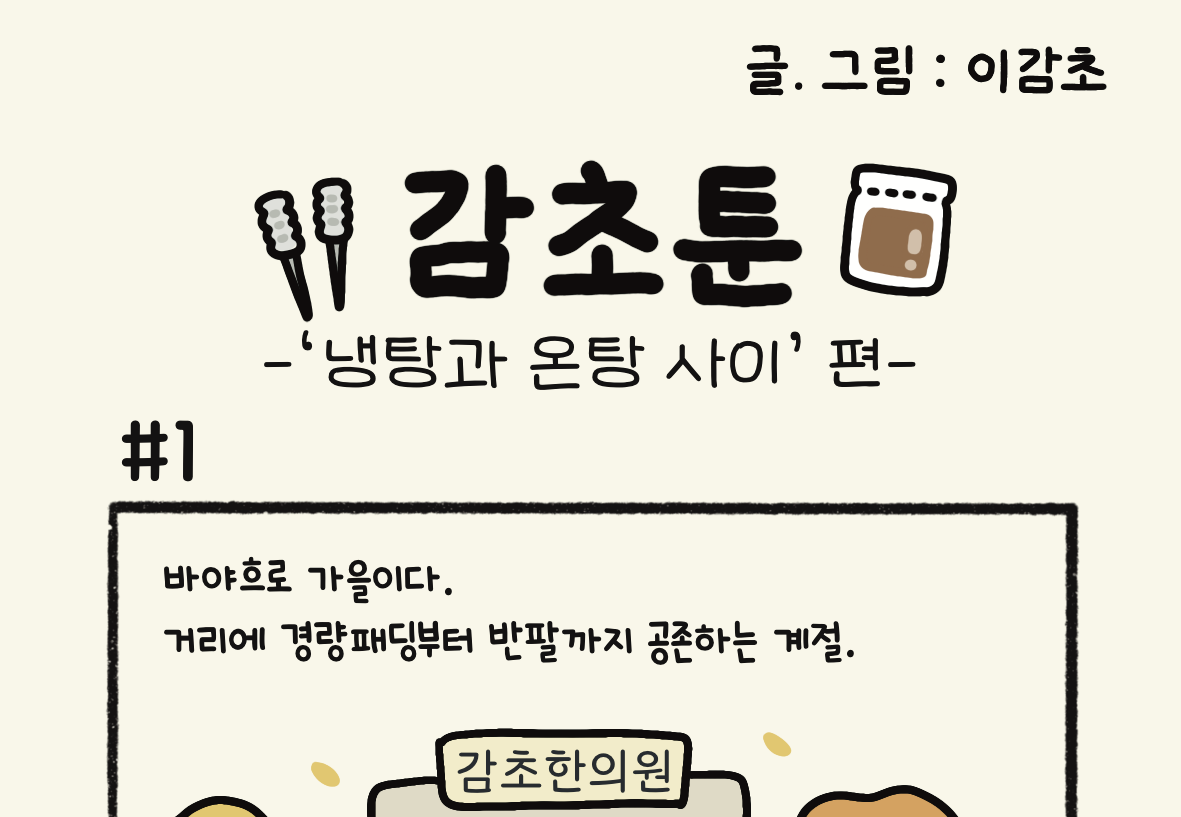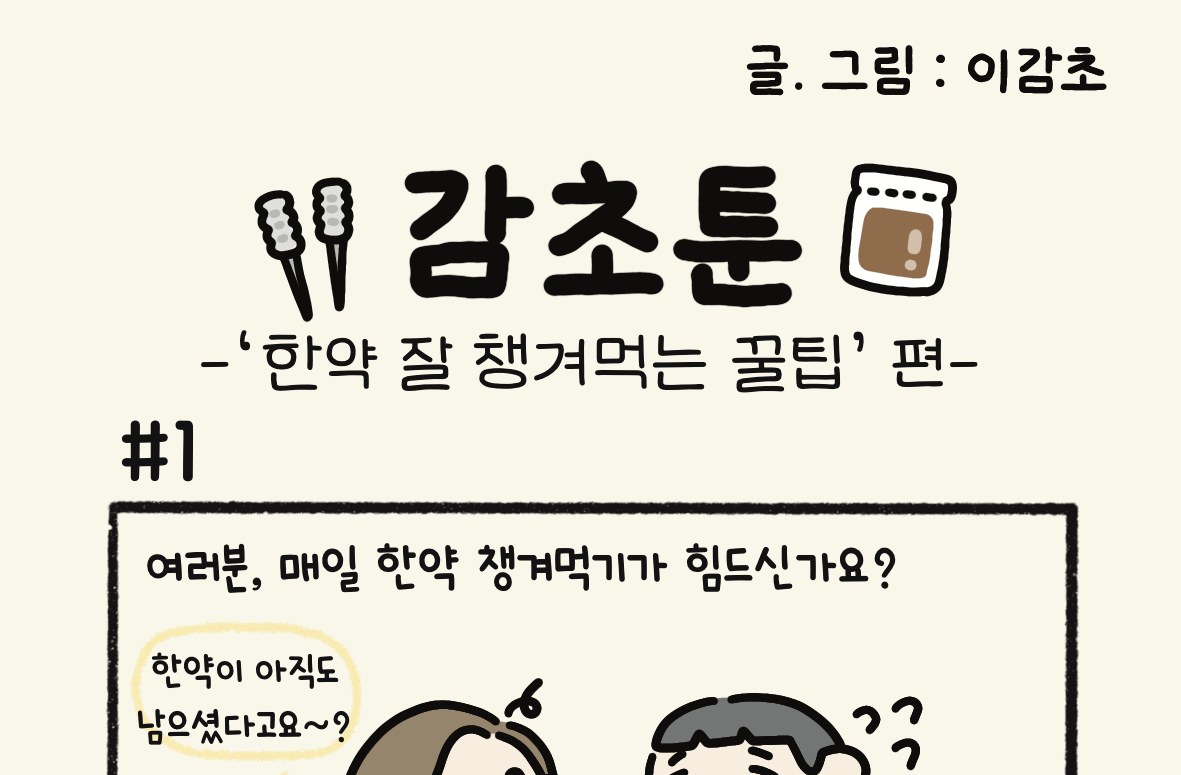김은혜 치휴한방병원 진료원장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원장의 글을 소개한다.
오랜만에 한참 어린 후배들을 만나서, 어쩌면 심적으로 가장 힘들 지금 세대들의 고민을 들었다. 고민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진료 현장을 만들었을 때, 한의사로 밥 벌어 먹고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시야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장이 어떤지 알고 있기에 선뜻 ‘당연히 가능하지’라는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했던 말은, “들리는 얘기로는 여는 곳마다 다 잘 된다는 말뿐이더라. 우리도 참 신기하다고들 말한다.”이었다.
현실이 그랬고 내 지난 경험도 그랬다. 학교에 가까워지면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한편, 막상 임상의 최전방에 뛰어들면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를 쳐내기가 바쁜 하루하루가 보이곤 한다.
필자와 같은 1990년대 생 기준, 과거의 세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진료와 관련된 사담이 각자 적어도 1개씩은 있는, 응급 뇌졸중 환자를 살려낸 경험들이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야”
당시에는 누가 더 긴박한 상황에서, 더 절박하게 뛰어다니며 마침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는가와 같은 경쟁을 가장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이는 선배들의 모습이 영원히 이어 내려갔으면 했다. 가끔 술 한 잔씩 하면 나오는, 끝내 집으로 보내지 못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얼굴들도 영원히 남아있으면 했다.
이 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학창 시절 중에 당시 가장 뜨거웠던 사담은 ‘근골격계 증상에는 한의원 한번 가봐야지.’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대중화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과거와 현재의 세대들에 대한 존경심에 기반 된 이야기들이었다.
이 인식의 시초였던 분이 그 연세에, 그 시절에 학교 강의를 오셔서 하신 말씀이 “허리가 삐끗했다며 환자가 왔어. 근데 이런 증상도 같이 얘기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정형외과 보내야 하고, 그 외는 딱 10번 치료받자, 얘기하고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근데 너네는 아는 게 없지 지금. 그러니까 해부학은 기본, 무조건 공부해. 그냥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야.”였다.

“어차피 그런 환자는 열 명에 한 명꼴인데”
그렇다면 나는, 우리 세대는 뒤를 이어서 무엇을 이어 내려주고 남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 그 생각의 토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금의 한의사가 갖춰야 할 지식, 능력,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2024년 역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책임감이 커졌다.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이 커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더 많아졌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느 치료든 부작용은 무조건 있다. 하지만 한의사로서 우리가 수행한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의 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도구만으로 모두 (또는 유의미한 어느 정도라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 이상, 우리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이 필수 의료라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적극적인 수용을 함과 동시에, 항상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가 종료된, 또는 중단된 질환 및 환자에 대한 넓은 시야와 심도 깊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어차피 그런 환자는 열 명에 한 명꼴인데.’ ‘어차피 내가 처방할 수 있는 도구도 아닌데’라는 말은, 앞선 세대들로부터 내리받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이 후배들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특히 한의 의료는, 태생부터가 임상 현장의 마음가짐과 분위기가 제도와 체계를 바꾸는 역사를 보내왔다. 때로는 정말로 막막한 현실이지만, 인생은 고행의 연속임에도 해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도전하는 한의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면 한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누군가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신념은 끝까지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과 확신을 담으며 글을 마친다.
 속초8.4℃
속초8.4℃ -0.3℃
-0.3℃ 철원-0.8℃
철원-0.8℃ 동두천0.1℃
동두천0.1℃ 파주0.0℃
파주0.0℃ 대관령3.2℃
대관령3.2℃ 춘천0.2℃
춘천0.2℃ 백령도4.2℃
백령도4.2℃ 북강릉10.4℃
북강릉10.4℃ 강릉11.3℃
강릉11.3℃ 동해8.8℃
동해8.8℃ 서울2.8℃
서울2.8℃ 인천2.0℃
인천2.0℃ 원주3.9℃
원주3.9℃ 울릉도9.9℃
울릉도9.9℃ 수원3.5℃
수원3.5℃ 영월1.8℃
영월1.8℃ 충주2.7℃
충주2.7℃ 서산4.3℃
서산4.3℃ 울진11.2℃
울진11.2℃ 청주4.5℃
청주4.5℃ 대전5.8℃
대전5.8℃ 추풍령3.8℃
추풍령3.8℃ 안동3.5℃
안동3.5℃ 상주2.4℃
상주2.4℃ 포항11.4℃
포항11.4℃ 군산6.7℃
군산6.7℃ 대구7.9℃
대구7.9℃ 전주10.9℃
전주10.9℃ 울산12.0℃
울산12.0℃ 창원8.8℃
창원8.8℃ 광주10.2℃
광주10.2℃ 부산13.8℃
부산13.8℃ 통영12.1℃
통영12.1℃ 목포12.0℃
목포12.0℃ 여수10.2℃
여수10.2℃ 흑산도11.1℃
흑산도11.1℃ 완도12.4℃
완도12.4℃ 고창11.4℃
고창11.4℃ 순천10.3℃
순천10.3℃ 홍성(예)4.4℃
홍성(예)4.4℃ 2.9℃
2.9℃ 제주16.8℃
제주16.8℃ 고산16.4℃
고산16.4℃ 성산16.7℃
성산16.7℃ 서귀포17.0℃
서귀포17.0℃ 진주9.1℃
진주9.1℃ 강화0.8℃
강화0.8℃ 양평3.4℃
양평3.4℃ 이천2.6℃
이천2.6℃ 인제0.6℃
인제0.6℃ 홍천1.1℃
홍천1.1℃ 태백5.8℃
태백5.8℃ 정선군1.9℃
정선군1.9℃ 제천2.3℃
제천2.3℃ 보은4.3℃
보은4.3℃ 천안5.0℃
천안5.0℃ 보령9.4℃
보령9.4℃ 부여4.4℃
부여4.4℃ 금산5.6℃
금산5.6℃ 5.7℃
5.7℃ 부안10.6℃
부안10.6℃ 임실10.2℃
임실10.2℃ 정읍12.2℃
정읍12.2℃ 남원8.6℃
남원8.6℃ 장수10.2℃
장수10.2℃ 고창군12.3℃
고창군12.3℃ 영광군10.3℃
영광군10.3℃ 김해시9.2℃
김해시9.2℃ 순창군9.2℃
순창군9.2℃ 북창원9.6℃
북창원9.6℃ 양산시11.2℃
양산시11.2℃ 보성군11.5℃
보성군11.5℃ 강진군12.1℃
강진군12.1℃ 장흥12.4℃
장흥12.4℃ 해남12.3℃
해남12.3℃ 고흥12.3℃
고흥12.3℃ 의령군6.7℃
의령군6.7℃ 함양군8.5℃
함양군8.5℃ 광양시11.5℃
광양시11.5℃ 진도군12.7℃
진도군12.7℃ 봉화5.0℃
봉화5.0℃ 영주3.6℃
영주3.6℃ 문경2.6℃
문경2.6℃ 청송군6.2℃
청송군6.2℃ 영덕10.9℃
영덕10.9℃ 의성4.6℃
의성4.6℃ 구미5.0℃
구미5.0℃ 영천7.6℃
영천7.6℃ 경주시10.2℃
경주시10.2℃ 거창8.3℃
거창8.3℃ 합천7.6℃
합천7.6℃ 밀양9.1℃
밀양9.1℃ 산청5.7℃
산청5.7℃ 거제10.4℃
거제10.4℃ 남해9.4℃
남해9.4℃ 11.2℃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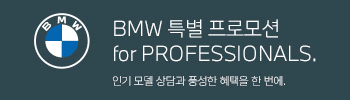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