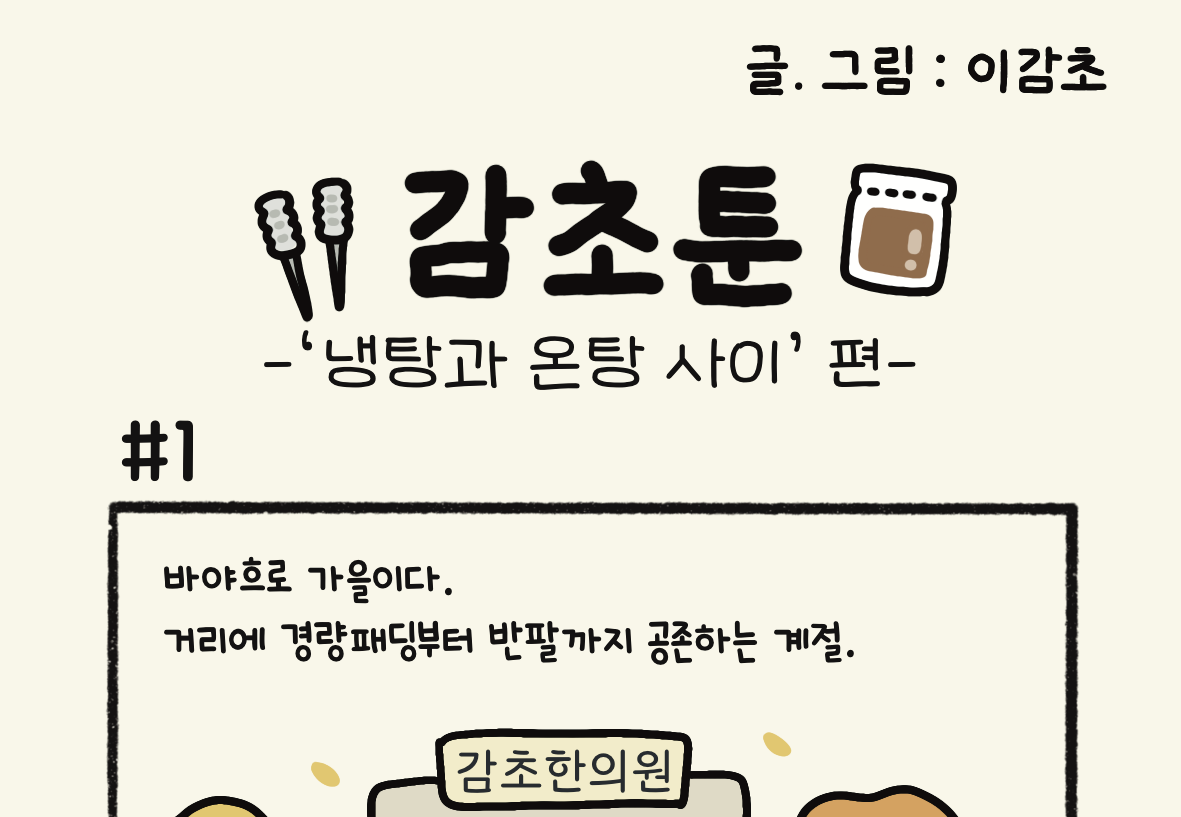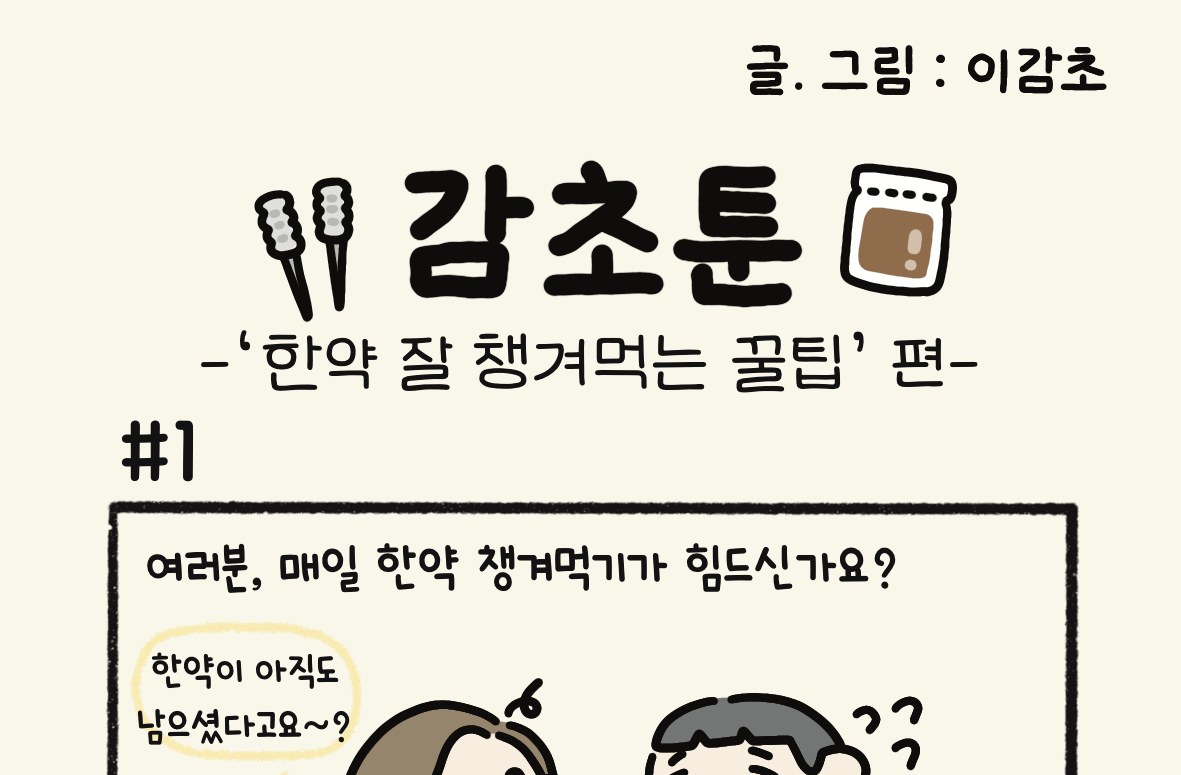본란에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최근 원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한 ‘동제신춘문예’ 공모전의 수상작(시, 수필)을 소개한다.

양진규 학생
(부산대 한의전 한의학과 2년)
나는 내가 서른이 될 줄 몰랐다. 서른의 나이로 감히 인생과 경륜(經綸)에 대해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얼마 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A교수님의 멋진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스물아홉의 아버지가 스물 셋의 어머니와 만나 서른에 나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서른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92년도의 아버지와 달리 22년도의 나는 아직 아이가 없다.
서른 살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는 그의 젊음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그를 많이 닮은 그의 아버지(나의 할아버지)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도, 정작 당신에 대해서는 멋쩍게 허허 몇 마디하고는 그쳤다.
그래서 나는 그저 앨범 속 필름 사진 몇 장과, 한 때 연극 무대에 섰었다는 바랜 이야기로 젊은 날 그의 정력과 열정, 분위기와 냄새를 떠올려 볼 뿐이다. 언젠가 첫 여자 친구와 처음 연극을 보러 갔을 때에도, 나는 이강백의 <결혼> 대사를 읊는 짙은 눈썹과 또렷하고 완고한 눈매의 남자를 잠시 생각했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계절은 겨울
수업에서,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계절과 시간을 살아간다 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계절은 겨울이었다. 밤 같은 새벽과 새벽 같은 밤이었다. 진한 술과 고소한 담배 냄새였으며 종종 꺼끌꺼끌하고 대부분 까무잡잡했다. 문 풍경(風磬) 소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구두소리는 항상 그 겨울의 찬기를 한껏 부여잡고 왔다.
현관에 선 채 날 안아 올리고는, 하루 만에 그 많은 수염이 어떻게 자란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의 볼에 항상 내 볼을 부비적대서 내복바람의 나는 한참을 발버둥 치고서야 그 품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주 가끔 평일 한낮에는 회사가 아닌 남문(南門)의 번화가에 서서 저번에 그 게임팩은 어땠어- 다른 걸로 한 번 바꿔갈까, 하던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를 기억한다.
이미 전화기보다 게임팩을 먼저 들고 있던 아버지를 지나치는 정오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 군대를 다녀오고, 준비하던 시험이 길어지면서 나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보다 더 집에서 멀어졌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벗어나려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게 어떤 아들이 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내가 먼저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어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우리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은 벅찼다. 불안하고 겁이 나는 내 미래를 멍하니 보고 있자면, 아버지가 애정으로 안는 그 품이 답답하고 숨 막혔다. 하나씩 더해가는 나의 나이에 비해 두 손에 쥔 건 삼색 펜 한 자루와 엄마 아버지의 시간을 담보로 잡은 나의 껍데기 같은 수험기간이었다.
나는 마감을 앞둔 고속터미널의 절화(折花)처럼, 팔리지 못하고 파란 플라스틱 양동이 속에 남겨진 채 시들어 갈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어느 늦은 저녁 퇴근길의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올 생각이 없는거냐, 장난스레 걸었던 전화를 나는 거칠게 펜을 내려놓듯 받았었다. 그렇지만 몇 개월 뒤 토요일의 시험을, 금요일 저녁이 아닌 수요일 아침에 굳이 갑작스레 응원하는, 그 배려와 망설임과 걱정을 나는 알고 있다.
여보세요, 하고 건너오는 목소리에는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번호를 찾아 통화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그 긴 시간들이 액정 위 지문자국처럼 겹겹이 묻어 있다는 것도, 누구보다 그와 닮은 나는 잘 안다.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자 때 늦은 사과 편지
그런 나의 아버지가 그런 나와 함께 서른 해를 지나왔다. 이제 몇 년 뒤 당신께서 은퇴하시고 나면 종종 시간을 보낼 작은 집을 짓고 계신다. 어떻니, 하고 아직 고구마 순이 푸르게 자라 있던 집터를 가리키면서,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 있던 마음을 둘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곤 뒤돌아 태우는 아버지의 담배냄새에서, 나는 그 옛날 현관에 선 남자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 땅이 우리의 터가 되기를 바란다 했지만, 언제나 나의 터는 아버지였다. 내가 나고 자란 그 터에, 앞으로도 우리의 기억을 뼈대 삼아 살을 붙여나가는 인생을 나는 살아갈 것이다.
엄마가 가계부 속지 첫 장에 그려주던 형광색 국화와 술에 취한 아버지의 손에 가지런히 꼭 들려오던 흰 초밥 종이가방. 왜 자꾸 이런 걸 사오냐, 하면서도 엄마는 웃었다. 종이가방을 살포시 내려놓고 빼꼼 열어보는 엄마를 아빠는 말없이 빙그레 바라보았다. 돌이켜보면, 하나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그런 사소한 기억들인 것 같다.
‘가족이나 다름없는’이라는 진부한 표현에서 드러나듯, 가장 가깝고 따뜻한 사이의 익숙한 냄새와 소리. 서른 살의 삶이란 그렇게 받아왔던 순간순간의 느낌을, 다시 소중한 사람들에게 추억으로 되돌려 줄 수 있게 되는 때라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글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물쭈물하는 고백이자 때 늦은 사과편지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이 작은 글에 감사함과 응원을 담아 보낸다.
 속초1.1℃
속초1.1℃ -6.3℃
-6.3℃ 철원-7.2℃
철원-7.2℃ 동두천-5.2℃
동두천-5.2℃ 파주-7.7℃
파주-7.7℃ 대관령-5.8℃
대관령-5.8℃ 춘천-6.5℃
춘천-6.5℃ 백령도0.0℃
백령도0.0℃ 북강릉-0.1℃
북강릉-0.1℃ 강릉1.9℃
강릉1.9℃ 동해2.8℃
동해2.8℃ 서울-3.2℃
서울-3.2℃ 인천-2.7℃
인천-2.7℃ 원주-4.0℃
원주-4.0℃ 울릉도4.6℃
울릉도4.6℃ 수원-4.0℃
수원-4.0℃ 영월-4.9℃
영월-4.9℃ 충주-5.3℃
충주-5.3℃ 서산-3.6℃
서산-3.6℃ 울진-0.6℃
울진-0.6℃ 청주-1.4℃
청주-1.4℃ 대전-2.0℃
대전-2.0℃ 추풍령-1.3℃
추풍령-1.3℃ 안동-2.1℃
안동-2.1℃ 상주-0.3℃
상주-0.3℃ 포항3.0℃
포항3.0℃ 군산-1.5℃
군산-1.5℃ 대구2.9℃
대구2.9℃ 전주-1.8℃
전주-1.8℃ 울산2.9℃
울산2.9℃ 창원4.7℃
창원4.7℃ 광주0.9℃
광주0.9℃ 부산4.7℃
부산4.7℃ 통영3.7℃
통영3.7℃ 목포3.0℃
목포3.0℃ 여수3.9℃
여수3.9℃ 흑산도5.1℃
흑산도5.1℃ 완도2.7℃
완도2.7℃ 고창-0.2℃
고창-0.2℃ 순천1.4℃
순천1.4℃ 홍성(예)-3.3℃
홍성(예)-3.3℃ -3.9℃
-3.9℃ 제주8.0℃
제주8.0℃ 고산8.2℃
고산8.2℃ 성산7.0℃
성산7.0℃ 서귀포8.5℃
서귀포8.5℃ 진주-2.6℃
진주-2.6℃ 강화-2.7℃
강화-2.7℃ 양평-2.3℃
양평-2.3℃ 이천-3.4℃
이천-3.4℃ 인제-4.9℃
인제-4.9℃ 홍천-5.1℃
홍천-5.1℃ 태백-5.3℃
태백-5.3℃ 정선군-3.5℃
정선군-3.5℃ 제천-5.5℃
제천-5.5℃ 보은-4.0℃
보은-4.0℃ 천안-2.7℃
천안-2.7℃ 보령-1.0℃
보령-1.0℃ 부여-3.6℃
부여-3.6℃ 금산-3.6℃
금산-3.6℃ -1.4℃
-1.4℃ 부안-0.1℃
부안-0.1℃ 임실-3.3℃
임실-3.3℃ 정읍-1.4℃
정읍-1.4℃ 남원-2.6℃
남원-2.6℃ 장수-4.5℃
장수-4.5℃ 고창군-0.4℃
고창군-0.4℃ 영광군0.1℃
영광군0.1℃ 김해시2.8℃
김해시2.8℃ 순창군-2.1℃
순창군-2.1℃ 북창원5.2℃
북창원5.2℃ 양산시3.8℃
양산시3.8℃ 보성군2.8℃
보성군2.8℃ 강진군3.4℃
강진군3.4℃ 장흥2.9℃
장흥2.9℃ 해남3.5℃
해남3.5℃ 고흥1.7℃
고흥1.7℃ 의령군-4.7℃
의령군-4.7℃ 함양군-0.5℃
함양군-0.5℃ 광양시3.3℃
광양시3.3℃ 진도군4.1℃
진도군4.1℃ 봉화-7.8℃
봉화-7.8℃ 영주-0.8℃
영주-0.8℃ 문경-0.7℃
문경-0.7℃ 청송군-4.3℃
청송군-4.3℃ 영덕0.8℃
영덕0.8℃ 의성-5.7℃
의성-5.7℃ 구미-1.1℃
구미-1.1℃ 영천1.3℃
영천1.3℃ 경주시2.9℃
경주시2.9℃ 거창-4.3℃
거창-4.3℃ 합천-2.4℃
합천-2.4℃ 밀양-0.9℃
밀양-0.9℃ 산청0.3℃
산청0.3℃ 거제5.7℃
거제5.7℃ 남해3.3℃
남해3.3℃ 2.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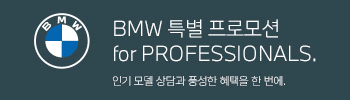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