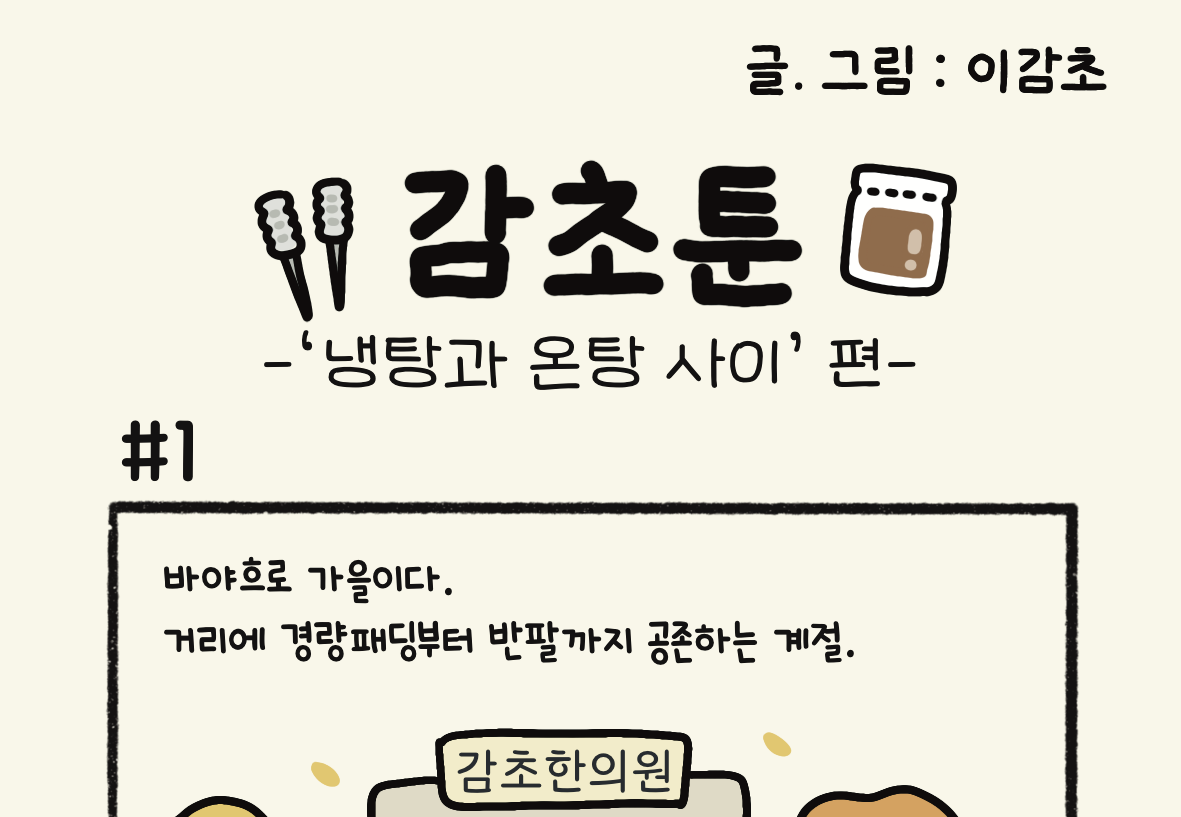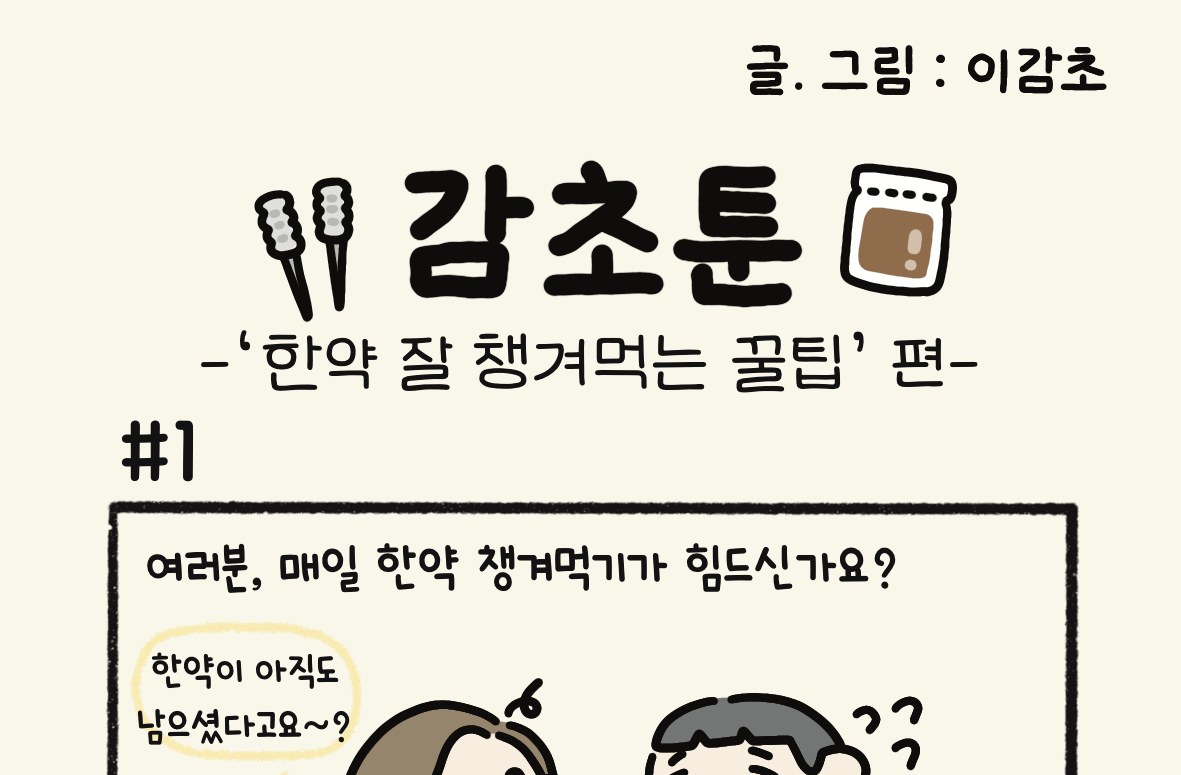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기획초청공연은 ‘명품 모노드라마 시리즈’였다.
이십 년 전에 내 마음을 울렸던 ‘염쟁이 유씨’가 모노드라마 시리즈 1에 올라와 있었다. 포스터를 보자마자, 주름마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배우의 얼굴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사투리가 메아리친다.
그의 금테 안경, 흰 머리, 가느다란 눈, 활짝 웃을 때 두드러지는 광대뼈, 역할마다 바꿔 쓰던 모자, 선글라스...... 무대에 관을 놓고 앉았다 일어섰다 돌아섰다 멈췄다 1인 15역으로 변신하던, 그야말로 종횡으로 무대를 누비던 배우의 표정이 눈앞인 듯 생생하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 살아 있구나, 이 배우가 여태껏 이 작품으로 살아 숨 쉬는구나, 반갑고 기쁘다. 예술은 길다. 그 긴 시간 동안 배우와 작품은 얼마나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을 것인가. 또 지금의 시대와 호흡하려 어떤 변신을 거쳤을 것인가. 한번 관람했을 뿐인데도 그날의 감동은 내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나 보다. 작품과 배우를 응원하는 마음이 물결처럼 밀려든다. 앞으로도 흥하시라! 오래 살아 숨 쉬시라!
두 작품을 빗금 그어 편집한 공연 포스터를 보자니, 이 시리즈를 기획한 주최 측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만하다. 두 작품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음, 그러므로 또한 삶.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지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주인공 유씨는 대대로 염을 하던 집안이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 하나 가업으로 해왔었고,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일터로 찾아온 관객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생각,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잊을 수 없는 성수대교 붕괴, 골리앗 타워 농성, 유람선 침몰 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기억들. 누구나 태어나면 피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일진대.
한편, 또 다른 장의사는 철저한 자본주의 방식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주도 대신해주고, 심지어 하객도 대신한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관객이 판단할 몫이다.
관객과 함께하는 염이 유씨에게는 마지막 염이다.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하는 유씨. 이별의 준비를 마친 유씨는 북받치는 슬픔에 힘들어한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할까? 수많은 죽은 이들을 돌봐온 유씨의 한 마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어. 근디 땅에만 묻혀버리고 살아남은 사람 가슴에 묻히지 못하면 그게 진짜 죽는 게여.”
◇아프다는 것
코로나 블루로 심리적인 불안감과 고립감 그리고 우울감으로 이상 행동까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육체적 불편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병의 세계에서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다.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과 내면을 해부하듯이 드러내야 한다. 병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죽음의 실체가 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임도 알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병, 상처,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코로나 시대의 병과 몸을 매개로 한 인간 실존의 내면세계와 삶을 서사적인 구성으로 시각화하는 본 작품은 삶이라는 병, 사랑이라는 증상, 신음처럼 새는 말, 가까이 있는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장소인 몸을 4부작 마임으로 보여준다.
1. 가슴을 쪼개 보이며 그가 말했다.
2. 죽이고 싶은 인간, 나도 있어요.
3. 나는 고인을 알지 못한다.
4. 얼마나 아프신가요?

◇예술이라는 것
나는 공연 홍보자료를 찬찬히 살핀다. 공연자의 ‘작품 의도’와 주최측의 ‘기획 의도’가 문장마다 스며 있다. 날것의 이 목소리들이 무대 위에서 몸짓으로 추임새로 대사로 표정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찡그림과 비명과 울음과 거친 호흡과 순간의 정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공연이다. 그래야 공연이다.
공연을 마쳤을 때 관객석에는 일고여덟 살쯤 되는 아이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었다. 인솔 선생님을 따라 객석을 조르르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뒤늦게 우리 무대의 색깔과 무게를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으나, 곧 마음 한쪽이 따뜻해져 왔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의 무대를 품고 갔으리라. 이야깃거리와 질문거리들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리라. 그것이 공연이다. 그것이 예술이다.
 속초0.1℃
속초0.1℃ -4.1℃
-4.1℃ 철원-2.0℃
철원-2.0℃ 동두천-0.9℃
동두천-0.9℃ 파주-1.4℃
파주-1.4℃ 대관령-5.6℃
대관령-5.6℃ 춘천-0.9℃
춘천-0.9℃ 백령도-0.1℃
백령도-0.1℃ 북강릉0.7℃
북강릉0.7℃ 강릉2.3℃
강릉2.3℃ 동해2.1℃
동해2.1℃ 서울-0.5℃
서울-0.5℃ 인천-0.2℃
인천-0.2℃ 원주-1.9℃
원주-1.9℃ 울릉도2.6℃
울릉도2.6℃ 수원-0.5℃
수원-0.5℃ 영월-1.1℃
영월-1.1℃ 충주-3.2℃
충주-3.2℃ 서산-3.1℃
서산-3.1℃ 울진1.5℃
울진1.5℃ 청주0.8℃
청주0.8℃ 대전-1.0℃
대전-1.0℃ 추풍령-0.2℃
추풍령-0.2℃ 안동-0.4℃
안동-0.4℃ 상주-0.7℃
상주-0.7℃ 포항3.3℃
포항3.3℃ 군산-0.3℃
군산-0.3℃ 대구2.3℃
대구2.3℃ 전주0.2℃
전주0.2℃ 울산2.0℃
울산2.0℃ 창원4.6℃
창원4.6℃ 광주2.7℃
광주2.7℃ 부산4.3℃
부산4.3℃ 통영4.0℃
통영4.0℃ 목포2.5℃
목포2.5℃ 여수5.0℃
여수5.0℃ 흑산도3.7℃
흑산도3.7℃ 완도2.5℃
완도2.5℃ 고창-0.9℃
고창-0.9℃ 순천1.5℃
순천1.5℃ 홍성(예)-2.8℃
홍성(예)-2.8℃ -2.3℃
-2.3℃ 제주6.5℃
제주6.5℃ 고산6.5℃
고산6.5℃ 성산4.1℃
성산4.1℃ 서귀포9.2℃
서귀포9.2℃ 진주0.2℃
진주0.2℃ 강화-0.6℃
강화-0.6℃ 양평-0.4℃
양평-0.4℃ 이천-0.3℃
이천-0.3℃ 인제-0.8℃
인제-0.8℃ 홍천-1.3℃
홍천-1.3℃ 태백-3.4℃
태백-3.4℃ 정선군-3.1℃
정선군-3.1℃ 제천-4.7℃
제천-4.7℃ 보은-2.6℃
보은-2.6℃ 천안-2.2℃
천안-2.2℃ 보령-2.1℃
보령-2.1℃ 부여-2.0℃
부여-2.0℃ 금산-1.9℃
금산-1.9℃ -0.7℃
-0.7℃ 부안0.3℃
부안0.3℃ 임실0.3℃
임실0.3℃ 정읍0.9℃
정읍0.9℃ 남원-0.5℃
남원-0.5℃ 장수-3.6℃
장수-3.6℃ 고창군-0.9℃
고창군-0.9℃ 영광군-0.3℃
영광군-0.3℃ 김해시3.0℃
김해시3.0℃ 순창군0.6℃
순창군0.6℃ 북창원4.1℃
북창원4.1℃ 양산시2.5℃
양산시2.5℃ 보성군2.0℃
보성군2.0℃ 강진군2.6℃
강진군2.6℃ 장흥2.9℃
장흥2.9℃ 해남3.5℃
해남3.5℃ 고흥0.5℃
고흥0.5℃ 의령군-3.4℃
의령군-3.4℃ 함양군-1.3℃
함양군-1.3℃ 광양시4.1℃
광양시4.1℃ 진도군3.3℃
진도군3.3℃ 봉화-5.1℃
봉화-5.1℃ 영주-0.8℃
영주-0.8℃ 문경-1.8℃
문경-1.8℃ 청송군-4.0℃
청송군-4.0℃ 영덕1.2℃
영덕1.2℃ 의성-2.9℃
의성-2.9℃ 구미-0.9℃
구미-0.9℃ 영천1.2℃
영천1.2℃ 경주시-0.8℃
경주시-0.8℃ 거창-2.7℃
거창-2.7℃ 합천-0.2℃
합천-0.2℃ 밀양0.1℃
밀양0.1℃ 산청-0.1℃
산청-0.1℃ 거제3.0℃
거제3.0℃ 남해2.5℃
남해2.5℃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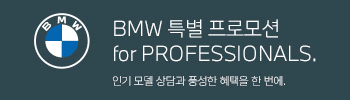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