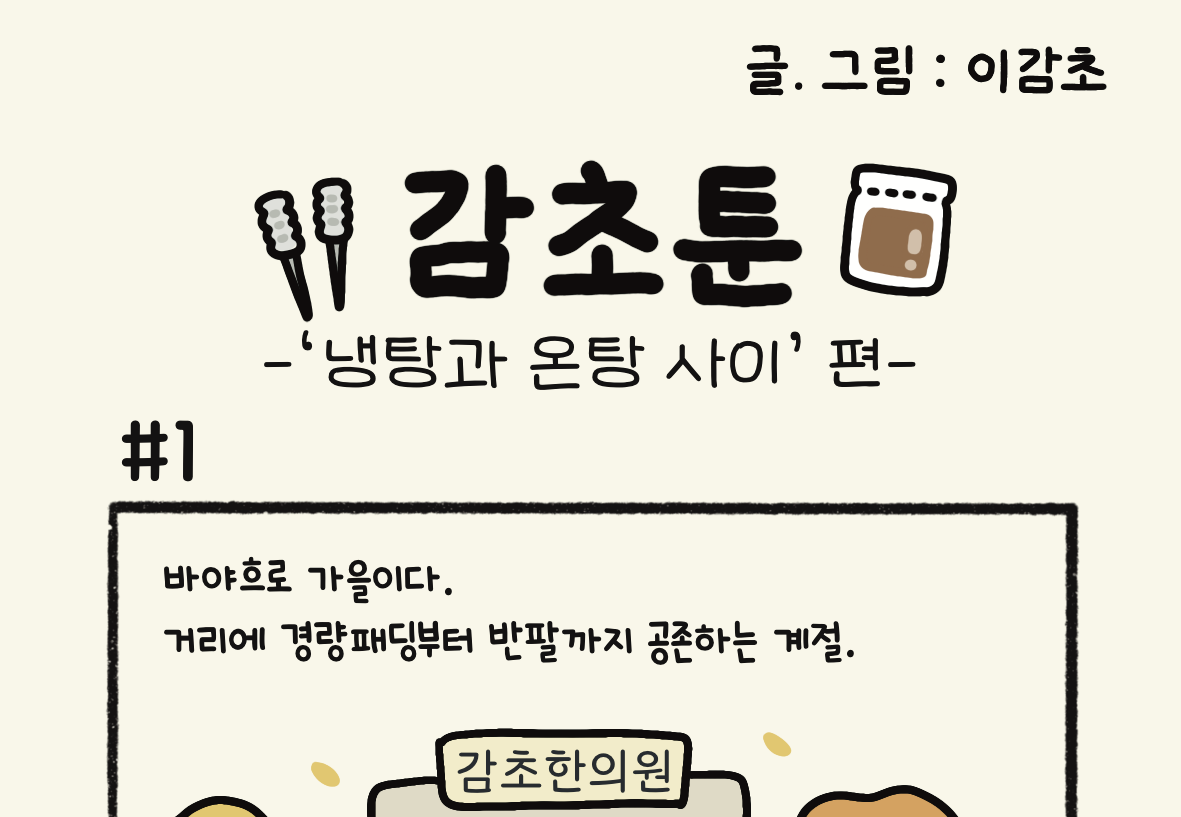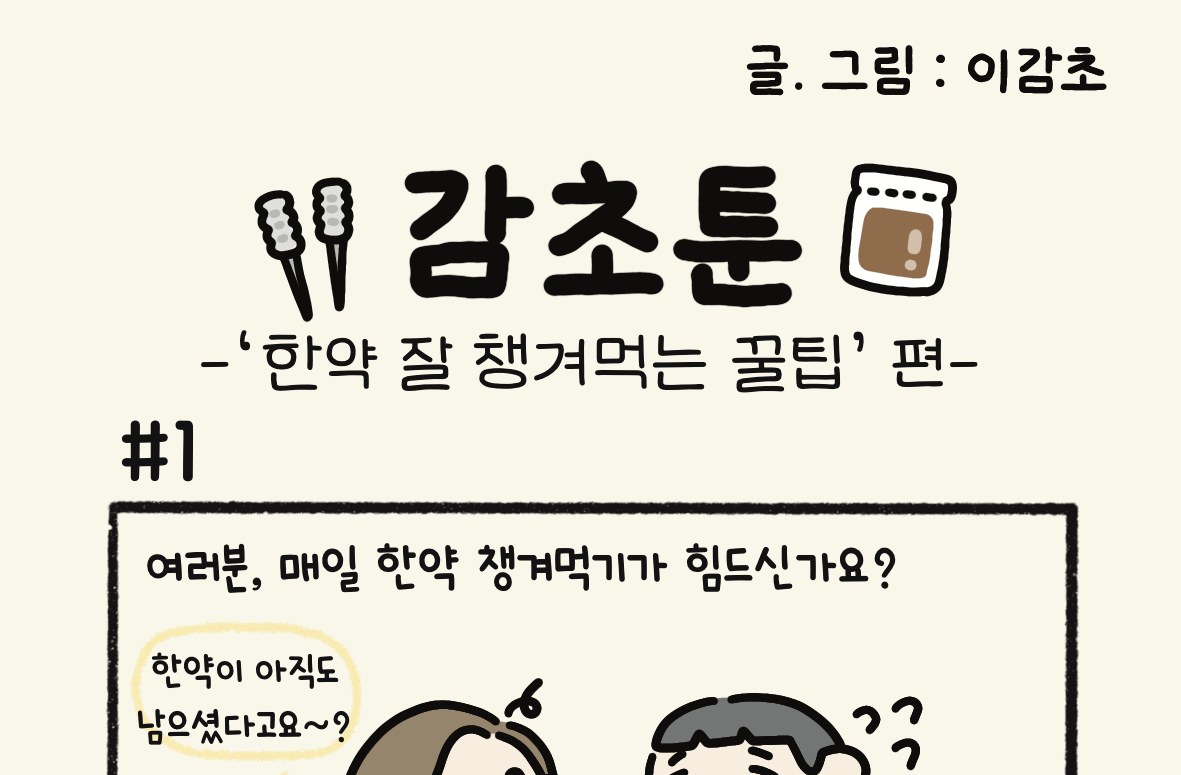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생이 등에 메고 있는 가방에 비죽이 솟은 원통이 보인다. 무어냐고 여쭙자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공연을 할 수 있어.” 원통의 뚜껑을 열자 돌돌 말린 한지가 통 안에 들어 있다.
“해외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종이라는 말을 듣고 말이지.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해. 천이거나 가죽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공연 내내 흔들고 구기고 잡아당겼는데 찢어지지 않으니까.”
한 존재가 흔들리며 거기에 있다
그가 발끝으로 한지의 양쪽을 밟고 서서 가슴께까지 오는 종이를 가득 펼쳐 그 뒤에 숨었다 나타났다 할 때, 공연을 처음 본 나는 그것이 한지인 줄 단번에 알았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천으로 보였을 것이다. 선생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 또한 외국 사람들의 눈을 상상하지 못했다.
바닥에 펼쳐 놓은 한지 위에 떨어진 꽃 조각들이 연한 풀냄새와 꽃냄새를 풍긴다. 선생은 천천히 한지의 양쪽 끝을 들어 올린다. 가운데가 처져 내린 한지를 넋인 양 어린아이인 양 이리저리 어르다가 선생은 한쪽 끝을 놓아버린다. 꽃 조각들이 튀밥처럼 허공에 뿌려진다. 남은 한지가 손끝에서 휘날린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나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떠올린다. 하필 한지는 저렇게 흰가.
미련도 없이 꽃을 뿌린 선생은 한지로 얼굴을 가리고 팔을 들고 벽에 붙어 선다. 한지 밑으로 그의 다리와 맨발이 보인다. 징 소리, 거문고 소리. 일렁이는 한지. 한 사람을 가린 채 허공에서 펄럭이는 한지는 마치 서 있는 혼령처럼 보인다. 급박한 리듬으로 흔들리자 한지는 물소리 같고 비닐 소리 같은 마치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낸다.
그는 이제 두 손으로 한지를 잡고 발가락 끝으로 한지를 밟아 세운다. 팽팽하고 네모난 한지가 조명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난다. 선생은 천천히 한지 뒤로 숨는다. 사람 그림자 하나가 한지에 비친다. 쭈그려 앉은 채 한지를 흔들자 흰 종이에 검은 그림자 하나, 한 존재가 덧없이 그러나 확연하게 흔들린다. 흔들리며 거기 있다.

마침내 스르르륵 그를 놓아준다
선생은 한지 위로 얼굴을 내민다. 두 손으로 한지를 모아 허공에 길게 눕히더니 손바닥을 쳐서 한지를 띄워 올린다. 둥실둥실 한지가 공중에서 논다. 날렵하게 한쪽 끝을 잡아챈 선생은 한지를 들고 걷는다.
얼굴을 덮은 채 한지를 가슴에 얹고 걸어 나온다. 가슴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얼굴을 감싸 조른다. 구겨지며 오그라붙은 한지가 흰 탈처럼 선생의 얼굴에 붙어 있다. 얼굴을 가린 탈. 얼굴을 가린 꽃. 선생은 바닥에 흩어진 꽃을 손으로 쓸어 한지 위로 냄새 맡는다. 한지에 꽃을 비빈다. 탈이 맡는 꽃향기. 그러나 아무리 한지를 뒤져도 거기에는 향기의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지를 모아 쥐어 기둥을 만든 선생은 손바닥에 올리고 허공에 기둥을 세우려 한다. 종이 기둥은 이내 꺾인다. 슬픈 표정으로 선생은 손아귀 가득 한지를 구겨 넣기 시작한다. 징 소리, 거문고 소리. 두 손 안으로 회오리치듯 구겨 넣은 한 줌의 종이 뭉치. 한 줌의 탈바가지. 한 줌의 얼굴. 한 줌의 넋. 손바닥에 올린 한 뭉치의 한지를 바라보다 선생은 천천히 한지를 당겨 편다. 하얀 탯줄 같은 한지가 생겨난다. 말아 접어 쥐더니 다시 부채처럼 펼친다. 흰 공작 깃털이 공중에 생겨난다.
선생은 이제 한지를 털기 시작한다. 빨래를 털듯이 힘차게 털며 제자리를 돈다. 한지 찰랑이는 소리가 무대에 가득하다. 찢어질까? 한지는 그래도 찢어질 줄 모른다. 사방팔방 시방세계에 한지를 뿌려대던 선생은 저러다가 기진하지 싶은 순간 고요히 멈춘다.
두 팔을 허공을 향해 뻗고, 한지로 얼굴과 가슴을 덮고, 선생은 기도하듯 멈춰 선다. 한 사람을 감싸는 흰 종이가 거기 있다. 접혔다가 펴졌다가 구겨졌다 다시 탈탈 털린 한지는 빳빳함도 잃고 주름투성이지만, 주름은 자국으로만 남아 한지를 차분하고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든다.
풍파가 다녀간 종이 한 장의 형상. 선생은 두 팔을 엇갈려 가슴 가득 한지를 감싸고 걸어 나오다가 마침내 스르르륵 그를 놓아준다. 한지는 한 장의 천과 같이 선생의 몸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눕는다. 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한 사람처럼, 혹은 선생의 분신처럼.
종이 한 장으로 하나의 사랑을 만들고, 하나의 죽음을 만들고, 하나의 넋을 달래고, 마침내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온 듯이 선생은 눈 감고 무대에 고요하게 서 있다.
풀물과 꽃물이 일생의 자국처럼 배어 있었다
이날 공연 노트에는 이렇게 적힌다. ‘꽃은 몸이다. 꽃이 손아귀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몸도 산산이 부서진다. 손아귀에는 향기만 남아 있다. 한지는 몸이다. 몸과 어우러지는 한지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몸이 살려달라고 소리친다. 몸이 죽어간다고 소리친다. 내 몸은 아직 살아 있다.’
환호와 함께 공연을 마치고 좁다란 출연자 대기실로 들어간 선생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다. 십여 분 동안 선생은 몸과 마음을 다 사른 듯했다. 정중동 동중정의 파도가 무대를 쓸고 빠져나갔다. 마룻바닥에는 여기저기 파편처럼 꽃송이와 부러진 꽃대들이 널려 있었다.
공연을 마친 뒤 선생은 나에게 잘 접힌 한지를 건넸다. ‘공연 끝나면 항상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거든.’ 한지를 펼치니 거기 풀물과 꽃물이 일생의 자국처럼 배어 있었다.
 속초-1.3℃
속초-1.3℃ -11.2℃
-11.2℃ 철원-10.9℃
철원-10.9℃ 동두천-9.0℃
동두천-9.0℃ 파주-9.5℃
파주-9.5℃ 대관령-10.4℃
대관령-10.4℃ 춘천-11.1℃
춘천-11.1℃ 백령도0.3℃
백령도0.3℃ 북강릉-1.9℃
북강릉-1.9℃ 강릉-2.8℃
강릉-2.8℃ 동해-2.3℃
동해-2.3℃ 서울-6.7℃
서울-6.7℃ 인천-5.9℃
인천-5.9℃ 원주-9.7℃
원주-9.7℃ 울릉도-0.7℃
울릉도-0.7℃ 수원-6.4℃
수원-6.4℃ 영월-11.3℃
영월-11.3℃ 충주-8.5℃
충주-8.5℃ 서산-7.8℃
서산-7.8℃ 울진-4.0℃
울진-4.0℃ 청주-6.1℃
청주-6.1℃ 대전-7.1℃
대전-7.1℃ 추풍령-8.4℃
추풍령-8.4℃ 안동-10.7℃
안동-10.7℃ 상주-6.0℃
상주-6.0℃ 포항-4.3℃
포항-4.3℃ 군산-7.0℃
군산-7.0℃ 대구-4.0℃
대구-4.0℃ 전주-6.0℃
전주-6.0℃ 울산-4.4℃
울산-4.4℃ 창원-3.8℃
창원-3.8℃ 광주-4.8℃
광주-4.8℃ 부산-3.9℃
부산-3.9℃ 통영-2.9℃
통영-2.9℃ 목포-4.5℃
목포-4.5℃ 여수-3.6℃
여수-3.6℃ 흑산도1.4℃
흑산도1.4℃ 완도-4.7℃
완도-4.7℃ 고창-6.7℃
고창-6.7℃ 순천-6.4℃
순천-6.4℃ 홍성(예)-8.0℃
홍성(예)-8.0℃ -8.0℃
-8.0℃ 제주3.3℃
제주3.3℃ 고산2.0℃
고산2.0℃ 성산-0.1℃
성산-0.1℃ 서귀포1.6℃
서귀포1.6℃ 진주-7.9℃
진주-7.9℃ 강화-7.3℃
강화-7.3℃ 양평-8.4℃
양평-8.4℃ 이천-8.7℃
이천-8.7℃ 인제-9.9℃
인제-9.9℃ 홍천-11.2℃
홍천-11.2℃ 태백-8.6℃
태백-8.6℃ 정선군-12.1℃
정선군-12.1℃ 제천-10.7℃
제천-10.7℃ 보은-9.1℃
보은-9.1℃ 천안-7.9℃
천안-7.9℃ 보령-6.9℃
보령-6.9℃ 부여-8.3℃
부여-8.3℃ 금산-8.9℃
금산-8.9℃ -8.0℃
-8.0℃ 부안-4.4℃
부안-4.4℃ 임실-9.1℃
임실-9.1℃ 정읍-6.8℃
정읍-6.8℃ 남원-8.5℃
남원-8.5℃ 장수-11.1℃
장수-11.1℃ 고창군-6.4℃
고창군-6.4℃ 영광군-5.7℃
영광군-5.7℃ 김해시-5.3℃
김해시-5.3℃ 순창군-9.2℃
순창군-9.2℃ 북창원-3.8℃
북창원-3.8℃ 양산시-2.9℃
양산시-2.9℃ 보성군-5.8℃
보성군-5.8℃ 강진군-6.9℃
강진군-6.9℃ 장흥-6.9℃
장흥-6.9℃ 해남-7.1℃
해남-7.1℃ 고흥-5.5℃
고흥-5.5℃ 의령군-10.7℃
의령군-10.7℃ 함양군-3.2℃
함양군-3.2℃ 광양시-5.6℃
광양시-5.6℃ 진도군-3.7℃
진도군-3.7℃ 봉화-9.2℃
봉화-9.2℃ 영주-9.8℃
영주-9.8℃ 문경-7.0℃
문경-7.0℃ 청송군-10.9℃
청송군-10.9℃ 영덕-5.0℃
영덕-5.0℃ 의성-11.5℃
의성-11.5℃ 구미-6.4℃
구미-6.4℃ 영천-5.1℃
영천-5.1℃ 경주시-3.7℃
경주시-3.7℃ 거창-8.5℃
거창-8.5℃ 합천-7.6℃
합천-7.6℃ 밀양-5.2℃
밀양-5.2℃ 산청-3.3℃
산청-3.3℃ 거제-2.6℃
거제-2.6℃ 남해-5.0℃
남해-5.0℃ -3.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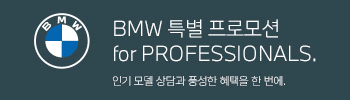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