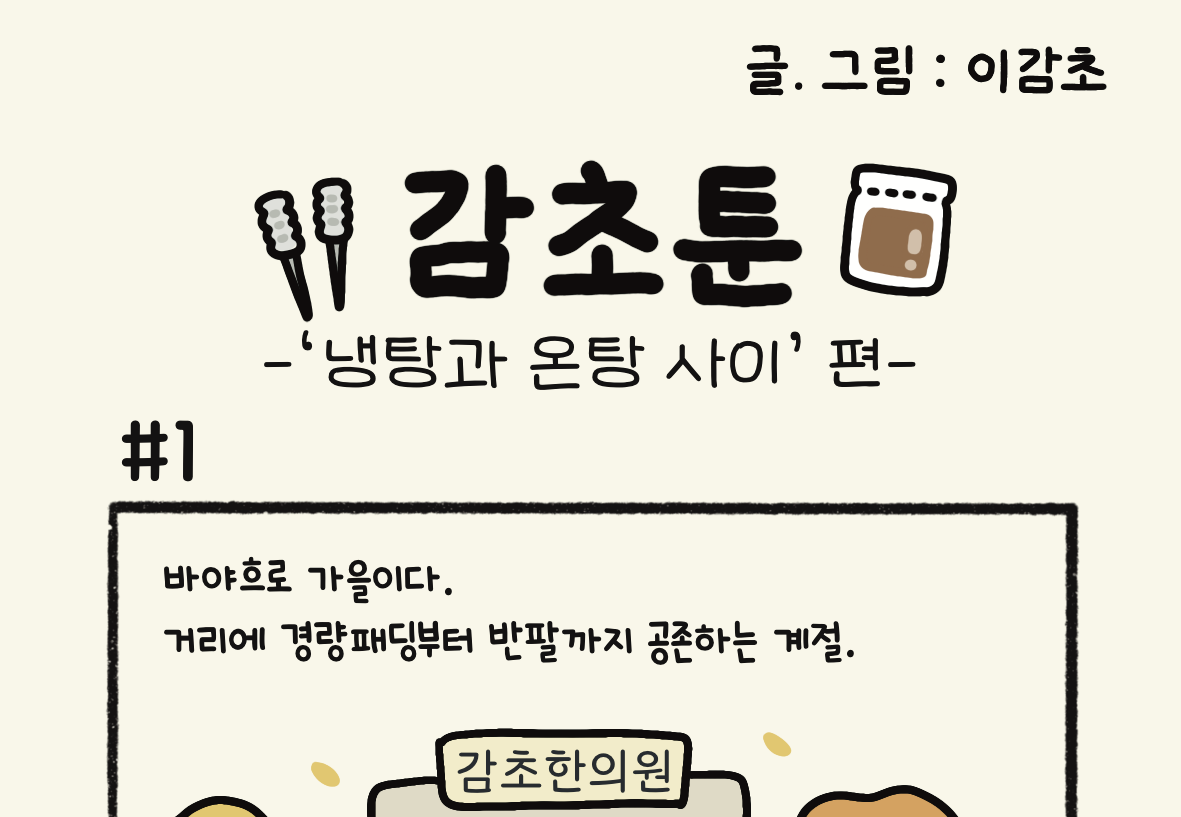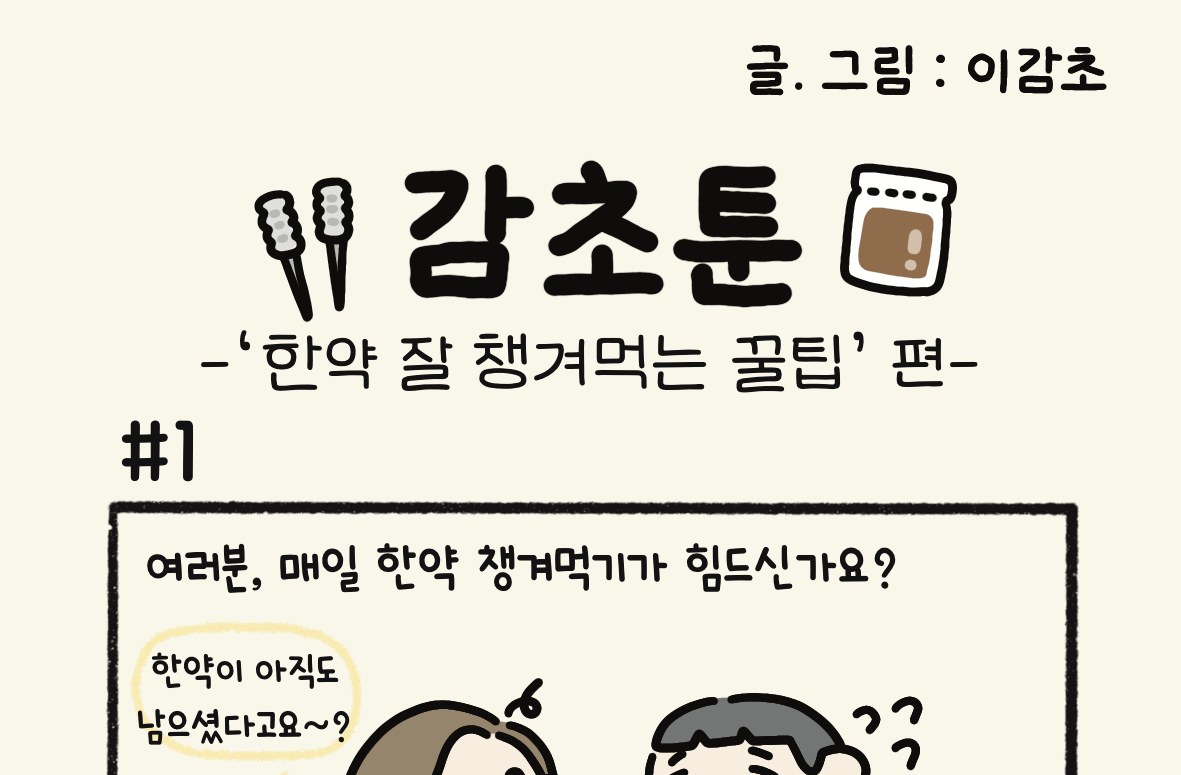문저온 보리한의원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공연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에세이 형태로 쓴 ‘시선나누기’ 연재를 싣습니다. 문저온 보리한의원장은 자신의 시집 ‘치병소요록’ (治病逍遙錄)을 연극으로 표현한 ‘생존신고요’, ‘모든 사람은 아프다’ 등의 공연에서 한의사가 자침하는 역할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건 파리에서 온 전보예요. 매일 와요. 어제도 오늘도 받았죠. 그 옹졸한 사람이 다시 병이 나서 또 안 좋대요……그인 용서를 빌며 돌아오라고 간청하는데, 사실 난 파리로 가 그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뻬쨔, 당신 얼굴이 굳어졌군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인 병들고 혼자고 불행한데, 그곳에서 누가 그일 돌보고 누가 그이 잘못을 감싸주고 누가 그이에게 때맞춰 약을 주겠어요? 그리고 시치미 떼거나 감추면 뭐해요, 내가 그일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이건 내 가슴에 놓여 있는 돌이고 이 돌 때문에 내가 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난 이 돌을 사랑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뻬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각각 외따로운 섬처럼 홀로 있을 것
‘류보비 안드레예브나’가 말한다.
하이라이트 조명 아래서 바닥에 놓여 있던 흰 종이를 집어 들면서 두 손을 맞잡아 비볐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뒤돌아섰다가 다시 간절하게 앞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짚거나 허리에 짚은 손을 다시 모아 앞을 향해 애걸하듯 펼치다가 의자에 풀썩 앉고 다시 서성인다. 치마를 쥐었다가 앞으로 뒤로 두어 걸음 걷다가 미친 듯이 히죽이는 순간을 지우고 복받쳐 울듯이 허공을 잡는다.
정적과 함께 서서히 무대가 어두워진다.
나는 배우의 황금빛 공단 치맛자락과 섬세한 주름이 잡힌 블라우스와 어깨에 닿는 가벼운 파마머리와 나이가 짐작되는 주름진 손과 얼굴을 본다. ‘흐읍’ 들이마시는 대사 중간 중간의 다급한 숨소리도 듣는다. 앉은 자리에서 배우가 선 곳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잰다. 일 미터, 이 미터, 삼 미터. 이따금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침방울도 불빛에 비쳐 보이는 소극장 중의 소극장. 내가 앉은 오른쪽으로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배우들도 나란히 앉아 있다. 독백 경연대회. 독백이므로 무대에는 오로지 한 사람이 선다. 그러니 출연자 대기석에 앉은 배우들도 각각 외따로운 섬처럼 홀로 있을 것이다. 가슴을 쿵쾅거리면서 숨을 가다듬으면서.

무대 뒤에서 호명을 기다리는 배우를 생각
안톤 체호프의 작품 <벚꽃 동산>을 열연하는 배우를 넋 놓고 보다가 나는 ‘이 돌’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하고 울린다. ‘이건 내 가슴에 놓여 있는 돌이고 이 돌 때문에 내가 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이것이 희곡의 묘미일 것이다. 또한 연극의 묘미일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대사보다도 얼마쯤 멀리,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 같은, 문학 작품의 묘미일 것이다. 내 돌은 무엇인가? 내 가슴에 놓여 있는 돌은 어떤 것인가? 잔잔한 울렁임 같은 것이 내내 마음에 남아 어두운 무대를 오래도록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텅 빈 무대와 머리 위를 비추는 눈부신 조명. 조명의 뜨거운 열기. 이마 위가 너무 밝으므로 눈앞의 객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어둠. 몇 걸음이면 채워질 좁은 마룻바닥의 드넓은 막막함. 내 대사와 눈빛을 받아쳐 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는 고독. 짧으면 삼 분, 길어야 사오 분을 넘지 않는 단독으로 주어진 시간. 대사를 잊었을 때 맞닥뜨릴 영원 같은 적막. 떨리는 입술과 씰룩이는 볼. 휘청이는 다리와 어색한 걸음걸이. 그리고 리허설 때 맞춰 둔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딱딱한 의자.
나는 객석에서 무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무대 뒤에서 호명을 기다리는 배우를 생각해 본다. 그곳에서 무대를 주시하던 나의 차분하고도 설레던 시간을 생각해 본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와 약속된 자리에 서는 배우의 몸을 생각해 본다. 그 낯선 시간과 공간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입을 열어 첫 단어를 뱉을 때, 그 직전, 아무도 모르게 배우의 몸을 통과하는 조용한 들숨.
하얀 원피스로 수녀복을 차려입은 ‘아그네스’가 무릎을 꿇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 맑은 눈망울로 숨 가쁜 대사를 몰아치다 붉은 물감을 터뜨려 옷을 적신다. “착한 아기는 주님이 주시고 나쁜 아기는 엄마의 아래를 뚫고 들어가요. 오, 하나님, 그가 나를 보셨어요. 그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전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닦아야 해요. 내 손에 내 다리에…… 맙소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년 B’가 헐렁한 옷을 걸치고 걸어 나와 쓸쓸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야윈 그의 목에는 붕대 같기도 하고 파스 같기도 한 흰 천이 감겨 있다. “그 할머니가 물었어요. 니 목이 왜 그래? 나는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사람하고 말하는 기분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한 사람의 배우가 오롯이 무대를
검은 옷을 입은 ‘메피토스’가 등장한다. “거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무대 바닥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 든 그가 휙 돌아서며 긴 머리를 휘날린다. 무대를 휘저으며 객석을 가리키며 말한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참으로 몹쓸 곳입니다. 비참한 꼴로 사는 인간들이 딱해요. 나 같은 놈마저도 그 불쌍한 자들을 괴롭히고 싶진 않다니까요!”
누군가는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의 코트를 걸치고 눈앞의 보이지 않는 총구에 대고 쏘라고 오열하고, 누군가는 또박또박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데요!”
3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저 무대에 홀로 세워진다면, 어떤 대사를 읊을 것인가? 어떤 말과 눈빛을 풀어서 내보일 것인가? ‘한 사람의 배우가 오롯이 무대를 책임져야 한다’고 이 독백의 무대에 대해 진행자가 말한다. 그것은 인생과도 같은 것인가? 오롯이 책임진다는 경건함과 막막함 같은 것이.
 속초-4.4℃
속초-4.4℃ -11.4℃
-11.4℃ 철원-12.1℃
철원-12.1℃ 동두천-9.7℃
동두천-9.7℃ 파주-9.6℃
파주-9.6℃ 대관령-12.7℃
대관령-12.7℃ 춘천-12.0℃
춘천-12.0℃ 백령도-2.2℃
백령도-2.2℃ 북강릉-2.8℃
북강릉-2.8℃ 강릉-3.9℃
강릉-3.9℃ 동해-2.7℃
동해-2.7℃ 서울-6.5℃
서울-6.5℃ 인천-6.1℃
인천-6.1℃ 원주-9.9℃
원주-9.9℃ 울릉도-0.5℃
울릉도-0.5℃ 수원-6.5℃
수원-6.5℃ 영월-12.1℃
영월-12.1℃ 충주-9.4℃
충주-9.4℃ 서산-7.0℃
서산-7.0℃ 울진-4.3℃
울진-4.3℃ 청주-6.5℃
청주-6.5℃ 대전-7.9℃
대전-7.9℃ 추풍령-8.1℃
추풍령-8.1℃ 안동-8.7℃
안동-8.7℃ 상주-6.4℃
상주-6.4℃ 포항-4.5℃
포항-4.5℃ 군산-6.8℃
군산-6.8℃ 대구-4.3℃
대구-4.3℃ 전주-6.9℃
전주-6.9℃ 울산-4.5℃
울산-4.5℃ 창원-3.7℃
창원-3.7℃ 광주-5.1℃
광주-5.1℃ 부산-4.2℃
부산-4.2℃ 통영-3.4℃
통영-3.4℃ 목포-4.4℃
목포-4.4℃ 여수-3.6℃
여수-3.6℃ 흑산도1.8℃
흑산도1.8℃ 완도-4.4℃
완도-4.4℃ 고창-6.0℃
고창-6.0℃ 순천-5.7℃
순천-5.7℃ 홍성(예)-7.7℃
홍성(예)-7.7℃ -9.1℃
-9.1℃ 제주2.7℃
제주2.7℃ 고산1.8℃
고산1.8℃ 성산-1.0℃
성산-1.0℃ 서귀포1.8℃
서귀포1.8℃ 진주-7.3℃
진주-7.3℃ 강화-7.5℃
강화-7.5℃ 양평-8.6℃
양평-8.6℃ 이천-8.9℃
이천-8.9℃ 인제-10.5℃
인제-10.5℃ 홍천-11.7℃
홍천-11.7℃ 태백-8.9℃
태백-8.9℃ 정선군-10.8℃
정선군-10.8℃ 제천-10.7℃
제천-10.7℃ 보은-10.1℃
보은-10.1℃ 천안-8.9℃
천안-8.9℃ 보령-6.5℃
보령-6.5℃ 부여-8.4℃
부여-8.4℃ 금산-9.9℃
금산-9.9℃ -8.4℃
-8.4℃ 부안-5.8℃
부안-5.8℃ 임실-9.5℃
임실-9.5℃ 정읍-6.9℃
정읍-6.9℃ 남원-8.5℃
남원-8.5℃ 장수-11.4℃
장수-11.4℃ 고창군-6.5℃
고창군-6.5℃ 영광군-5.7℃
영광군-5.7℃ 김해시-5.1℃
김해시-5.1℃ 순창군-9.1℃
순창군-9.1℃ 북창원-3.4℃
북창원-3.4℃ 양산시-3.0℃
양산시-3.0℃ 보성군-4.2℃
보성군-4.2℃ 강진군-6.0℃
강진군-6.0℃ 장흥-6.6℃
장흥-6.6℃ 해남-6.4℃
해남-6.4℃ 고흥-5.5℃
고흥-5.5℃ 의령군-10.3℃
의령군-10.3℃ 함양군-3.8℃
함양군-3.8℃ 광양시-6.1℃
광양시-6.1℃ 진도군-4.1℃
진도군-4.1℃ 봉화-8.5℃
봉화-8.5℃ 영주-8.9℃
영주-8.9℃ 문경-7.1℃
문경-7.1℃ 청송군-9.2℃
청송군-9.2℃ 영덕-4.9℃
영덕-4.9℃ 의성-11.1℃
의성-11.1℃ 구미-5.9℃
구미-5.9℃ 영천-5.6℃
영천-5.6℃ 경주시-4.3℃
경주시-4.3℃ 거창-8.4℃
거창-8.4℃ 합천-7.5℃
합천-7.5℃ 밀양-4.4℃
밀양-4.4℃ 산청-4.7℃
산청-4.7℃ 거제-2.8℃
거제-2.8℃ 남해-4.6℃
남해-4.6℃ -3.9℃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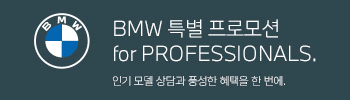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