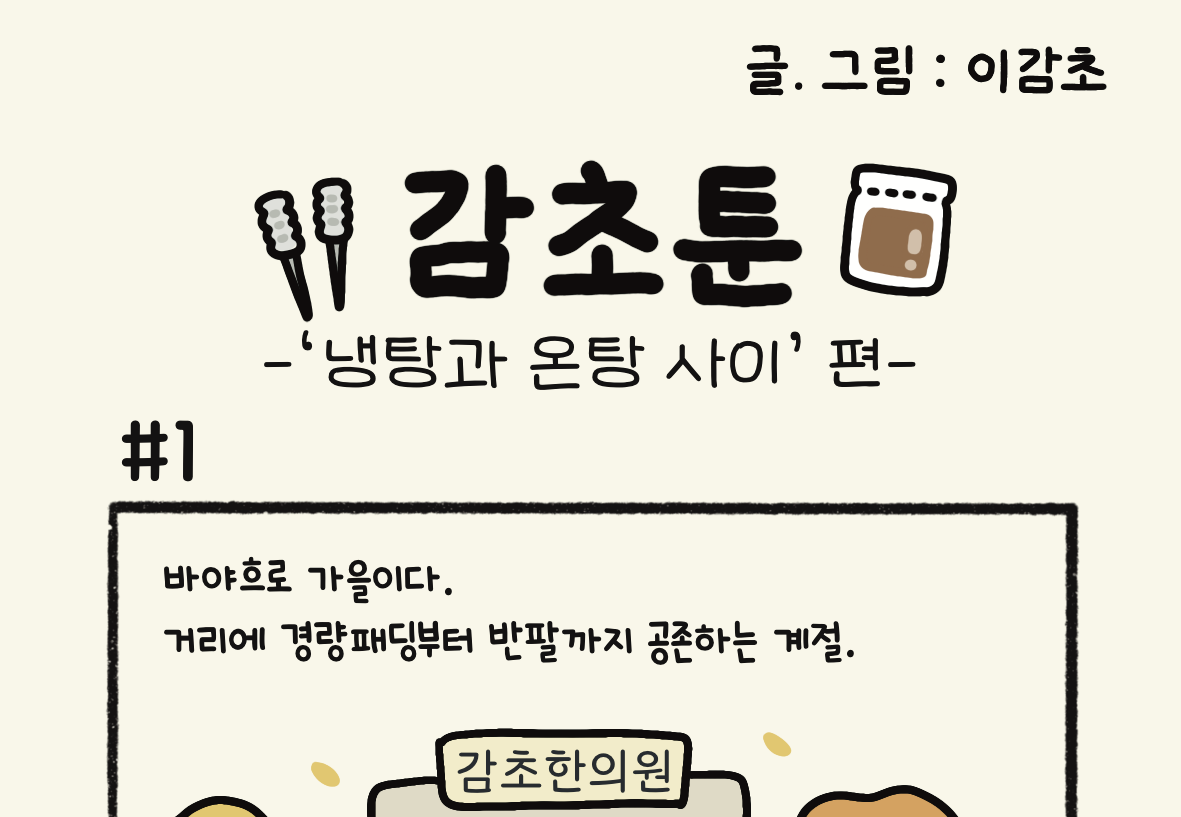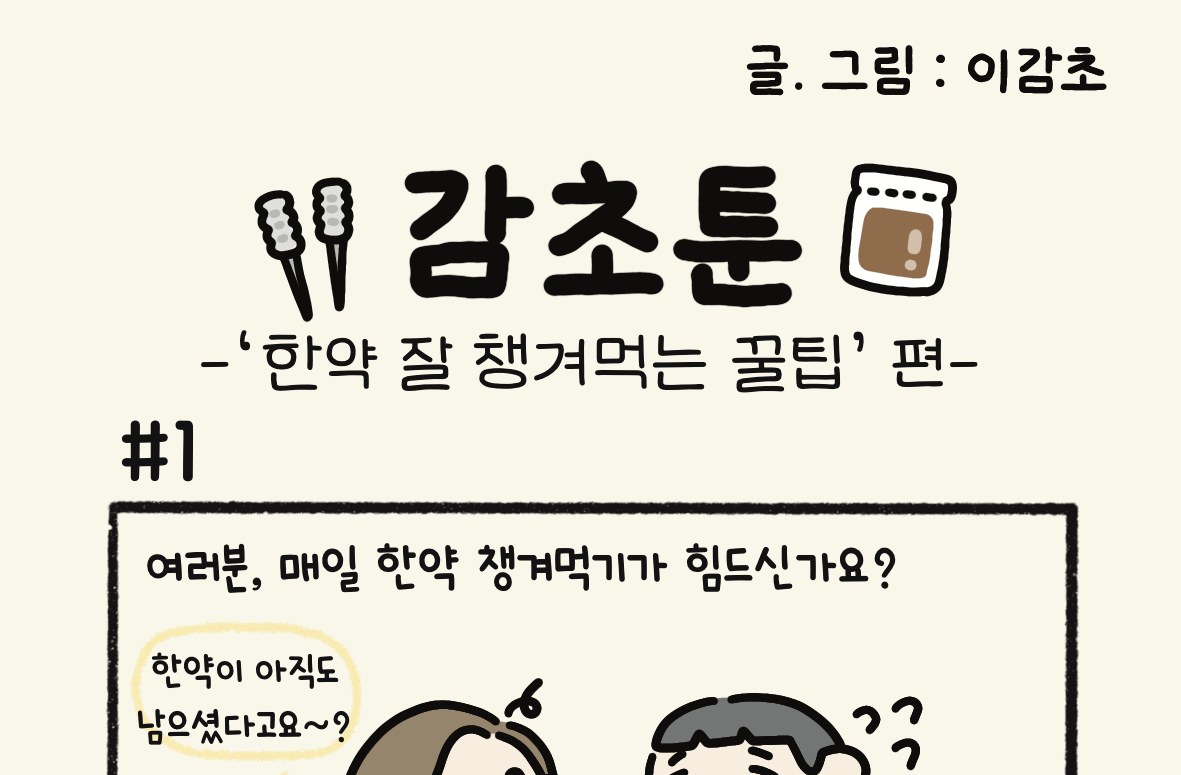어제는 할머님의 기일이었다. 저녁 늦은 시간, 후덥지근한 열대야의 날씨인데도 집안 분위기는 냉냉하다. 경건한 마음 탓에 분위기가 경직된 것이 아니다. 항상 제사에 엄한 격식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때문이다.
홍동백서, 조율이시, 반서갱동, 어동육서, 두동미서 등의 상차림 규정은 제사를 모시지 않는 가정이라도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매년 모시는 제사인데도 왜 항상 그 진설법은 그리도 어려운지. 어제도 나는 그림책을 힐끗 거리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제사 음식을 올렸다.
사실 나는 할머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어려서부터 영정으로 뵈어온 모습만이 기억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님께 오늘 감사드릴 일이 생겼다. 죽음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 제사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천에 계신 스승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종교라고 부를 만한 것은 유교밖에 없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유교? 그게 어떻게 종교가 되지? 종교의 필수요소는 내세관이라고 배웠는데,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잖아.’ 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다. 그렇다면 스승님은 과연 유교의 어떤 점을 보고 종교라고 생각하셨던 것일까.
내가 나의 뇌에 들어있던 생각들을 전부 의심하게 된 사건 이후, 약선당에 계신 스승께서는 ‘생명현상의 보편타당함’ 위에 지식을 쌓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다. 내가 제일 먼저 쌓아 올린 첫 번째 생각은 바로 내가 딸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이었다. “이 아이는 나와 내 아내가 낳은 우리 자식이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내 딸아이의 존재였다. 돌이 갓 지난 예쁜 딸을 가진 아빠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참으로 소박한 생각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지만 그 사실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곧이어 쌓아올려진 두 번째 생각은 “나는 죽는다”는 사실이었다.
유한한 나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리 저리 흔들리는 생각의 끝을 고정시켜 달라고 나의 뇌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난 내 생각의 끝을 어디엔가 접지시켜야만 했다.‘죽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답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죽음으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나라고 부를만한 무엇인가가 계속 남아있거나.
재미있는 것은 동양의 전통 속에 웬만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죽음으로 인한 존재의 완전한 소멸’을 선택한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학자였다. 공자는 죽음에 대한 물음에 “不可知”라고 대답하였고, 주자(朱子)와 정이천(程伊川) 같은 신유가(新儒家)는 영혼이나 귀신의 존재를 단호히 부정하였다.
한국종교학회에서 펴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유학 관련 부분을 본다.
“…사람은 기(氣)의 응취과정에서 생기는 정(精), 기(氣), 신(神)이나 그 결합체인 혼백(魂魄)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정기간 존속하다가 그 기운이 다하게 되면 혼(魂)은 양(陽)으로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魄)은 음(陰)으로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니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이제 정(精), 기(氣), 신(神)으로 설명하면 죽음은 처음에 먼저 혼(魂)이 분리되어 흩어지고 다음에 기(氣)와 정(精)이 일원기(一元氣)로 흩어져 돌아가 개체 인간이 영원히 없어지는 과정이다.…”
중국문명이 철저히 물질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유학의 생사관은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죽음을 통해 생명은 완전히 소멸한다고 생각했지만, 유학자들은 유한한 생명으로서 영원에 대한 갈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와 내 자식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보았을 터이고, 분명히 그 속에서 내 생명의 영원성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영원성에 대한 경건한 확인 행위로서 ‘제사’라는 의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영원성의 부여가 종교의 역할이라면, ‘제사’를 통해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유학은 종교에 못지않다. 이것이 스승께서 유교를 종교라 말씀하신 이유가 아닐까?
 속초4.5℃
속초4.5℃ -0.3℃
-0.3℃ 철원0.3℃
철원0.3℃ 동두천0.8℃
동두천0.8℃ 파주0.8℃
파주0.8℃ 대관령0.2℃
대관령0.2℃ 춘천0.2℃
춘천0.2℃ 백령도2.7℃
백령도2.7℃ 북강릉2.3℃
북강릉2.3℃ 강릉4.4℃
강릉4.4℃ 동해5.4℃
동해5.4℃ 서울2.7℃
서울2.7℃ 인천1.9℃
인천1.9℃ 원주1.7℃
원주1.7℃ 울릉도8.5℃
울릉도8.5℃ 수원2.5℃
수원2.5℃ 영월1.1℃
영월1.1℃ 충주2.2℃
충주2.2℃ 서산3.6℃
서산3.6℃ 울진7.1℃
울진7.1℃ 청주3.4℃
청주3.4℃ 대전3.3℃
대전3.3℃ 추풍령2.9℃
추풍령2.9℃ 안동1.7℃
안동1.7℃ 상주1.5℃
상주1.5℃ 포항7.2℃
포항7.2℃ 군산4.4℃
군산4.4℃ 대구4.3℃
대구4.3℃ 전주4.5℃
전주4.5℃ 울산7.3℃
울산7.3℃ 창원6.8℃
창원6.8℃ 광주7.3℃
광주7.3℃ 부산10.1℃
부산10.1℃ 통영8.7℃
통영8.7℃ 목포6.6℃
목포6.6℃ 여수8.6℃
여수8.6℃ 흑산도8.0℃
흑산도8.0℃ 완도8.1℃
완도8.1℃ 고창5.7℃
고창5.7℃ 순천7.4℃
순천7.4℃ 홍성(예)3.9℃
홍성(예)3.9℃ 2.3℃
2.3℃ 제주11.7℃
제주11.7℃ 고산11.1℃
고산11.1℃ 성산13.0℃
성산13.0℃ 서귀포14.4℃
서귀포14.4℃ 진주6.1℃
진주6.1℃ 강화1.7℃
강화1.7℃ 양평2.1℃
양평2.1℃ 이천1.6℃
이천1.6℃ 인제0.3℃
인제0.3℃ 홍천1.0℃
홍천1.0℃ 태백0.9℃
태백0.9℃ 정선군0.6℃
정선군0.6℃ 제천1.3℃
제천1.3℃ 보은3.0℃
보은3.0℃ 천안2.8℃
천안2.8℃ 보령4.2℃
보령4.2℃ 부여4.4℃
부여4.4℃ 금산4.2℃
금산4.2℃ 3.4℃
3.4℃ 부안5.5℃
부안5.5℃ 임실6.0℃
임실6.0℃ 정읍5.1℃
정읍5.1℃ 남원6.5℃
남원6.5℃ 장수4.9℃
장수4.9℃ 고창군5.5℃
고창군5.5℃ 영광군5.6℃
영광군5.6℃ 김해시6.1℃
김해시6.1℃ 순창군6.4℃
순창군6.4℃ 북창원6.9℃
북창원6.9℃ 양산시8.5℃
양산시8.5℃ 보성군8.7℃
보성군8.7℃ 강진군8.0℃
강진군8.0℃ 장흥8.0℃
장흥8.0℃ 해남7.3℃
해남7.3℃ 고흥9.0℃
고흥9.0℃ 의령군3.9℃
의령군3.9℃ 함양군5.2℃
함양군5.2℃ 광양시8.2℃
광양시8.2℃ 진도군7.2℃
진도군7.2℃ 봉화1.0℃
봉화1.0℃ 영주1.5℃
영주1.5℃ 문경1.1℃
문경1.1℃ 청송군2.5℃
청송군2.5℃ 영덕6.9℃
영덕6.9℃ 의성2.5℃
의성2.5℃ 구미2.7℃
구미2.7℃ 영천4.8℃
영천4.8℃ 경주시6.0℃
경주시6.0℃ 거창5.1℃
거창5.1℃ 합천5.5℃
합천5.5℃ 밀양7.1℃
밀양7.1℃ 산청4.6℃
산청4.6℃ 거제8.6℃
거제8.6℃ 남해7.2℃
남해7.2℃ 7.8℃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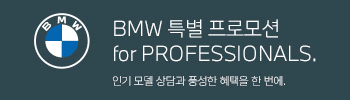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