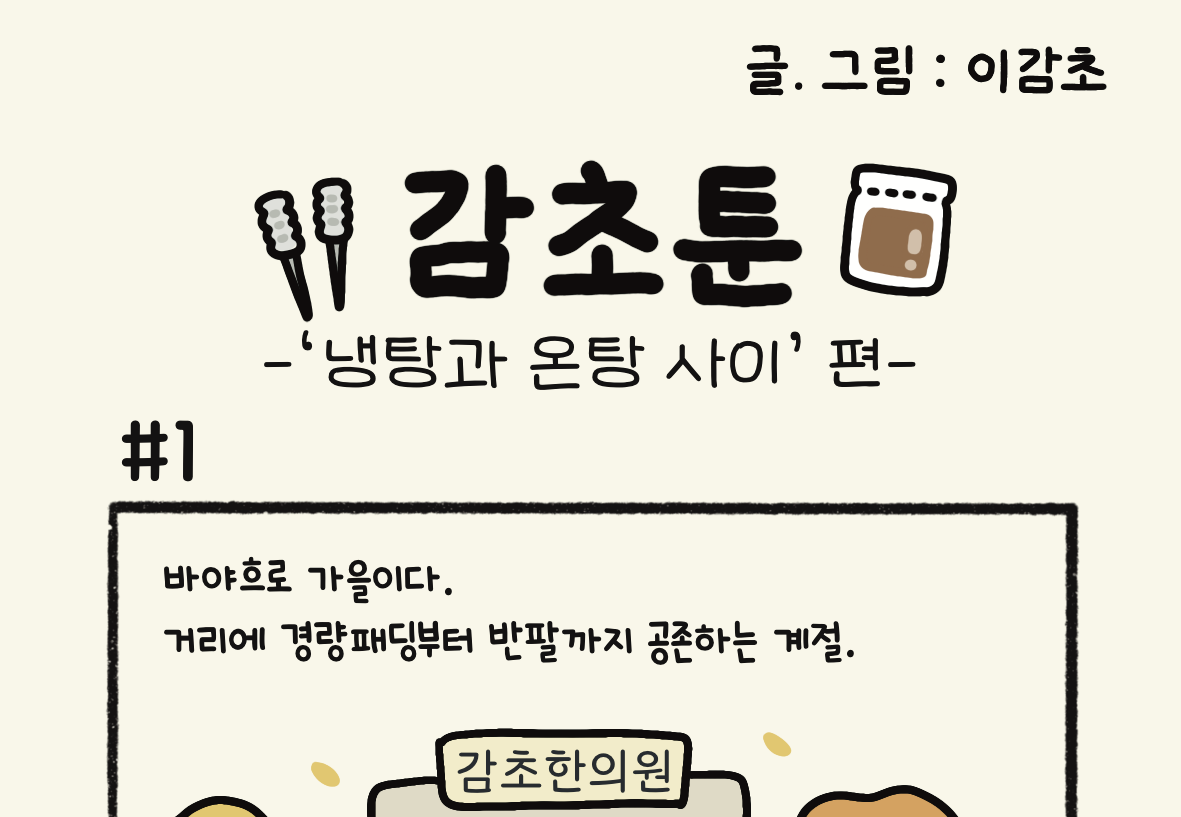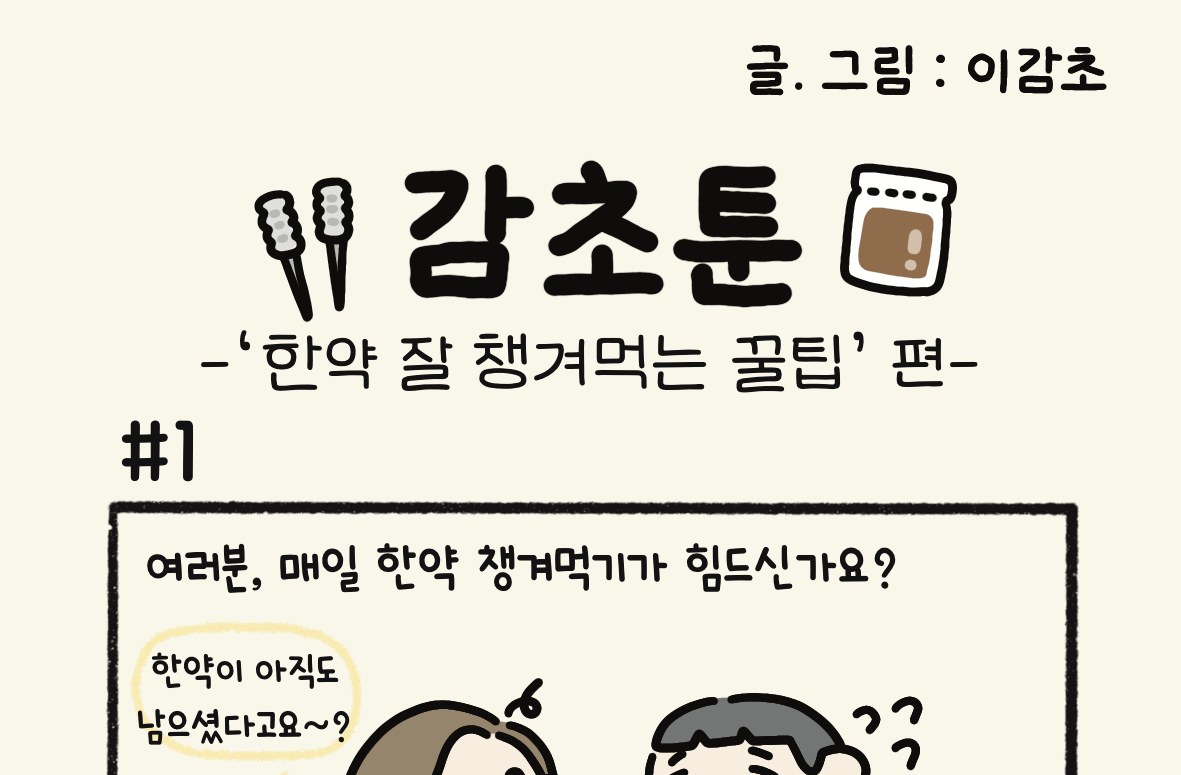나이 많아 당뇨나 고혈압을 동반한 만성질환 대부분
좀 더 뜻깊은 3년 시간 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어느덧 공보의 생활을 한지도 7개월이 다 되어간다. 처음 울진군 평해보건지소에 들러 같이 근무하게 될 직원들을 보니 다들 친절해 보였고, 관사시설도 좋아 신혼집 마련 걱정을 안 해도 돼 다행이었던 기억이 난다. 아직도 첫 근무할 때의 설레임은 잊을 수 없다. 그날이 5월8일 월요일이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머리에 무스를 발라 단정히 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수련의 시절 입었던 가운을 입고 책상에 앉아 첫 환자가 오길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라 진료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필자가 있는 울진군 평해읍은 3개면에 인구 4천명 정도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읍으로, 주위에는 논과 산이지만 차로 5분만 가면 바다도 볼 수 있고 도보로 10분이면 읍내를 모두 구경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시골이다.
평해보건지소는 내과, 치과, 한방과,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이 있어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매주 목·금만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그리고 각 과에 간호보조인력(보통 여사님이라 칭함) 한 명과 예방접종담당 인력 한 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필자도 경남 고성군의 시골마을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지만 당시에 보건지소에는 가지 않고 그냥 약국에만 다녀서 처음에는 보건지소가 낯설었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근골격계 동통질환을 호소하시는데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힘든 농사일에 몸은 아프지만 바쁘고 돈이 아까워 의료기관에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 병이 깊어져 만성질환이 되어서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아보지만, 연세가 많아 기력이 약해지고 당뇨나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어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질환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정확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손 한번 더 잡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다. 개인적으로 군 복무 대신에 하는 것이니 공보의 시절동안 적당히 환자보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여가를 즐기겠다는 안일한 생각보다 어차피 겪을 3년이라면 힘들고 바쁘더라도 좀더 의미 있는 3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칠순이 넘은 한 할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져 좌측반신불수가 되어 식사 외엔 스스로 앉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처음 5월에 보았을 때 식욕 저하로 체중이 빠져 거의 성냥개비 같아 안타까웠는데 침·뜸·한약(엑기스제) 치료를 계속하면서 식사를 잘 하게 되어 이젠 살이 제법 쪄서 통통한 얼굴이 되셨다. 이렇게 방문진료로 호전이 있으면 보람을 느끼지만 모든 방문진료 대상자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다.
55세의 한 아주머니는 중풍이 온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장골에 골절이 와서 수술했다가 마취가 깨고 나서부터 차츰 치매증상이 보이면서 인격장애·기억장애가 있는 환자였다.
아저씨와 아들이 번갈아 가며 간호를 하며 지내는데 호전될 기미는 안 보이고 상태는 여전했다. 그래도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 병 낫겠죠?”라고 소녀처럼 물으실 때는 “그럼 낫죠! 아주머니도 낫는다고 좋게 생각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죄송스럽기만 한 건 왜일까. 내년에는 꼭 이 아주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농촌에 있으면 자연의 변화를 도시보다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녹음이 짙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다 떨어지고, 들녘에 있던 벼들도 추수를 마치고 이젠 쓸쓸하게 텅빈 논바닥을 드러낼 뿐이다.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울’ 뿐이다. 이곳 평해 주민들도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고 다들 따뜻한 가게나 마을회관에 두런두런 모여 심심풀이 화투를 치거나 술 한잔 하면서 한해의 노고를 풀곤 한다. 모이면 자식 자랑이나 걱정거리, 내년 농사준비 등을 서로 얘기하며 하루를 보내시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찍 주무시겠지.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날 일을 하며 또 그렇게 하루가 흘러간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지내는 사람들. 난 이 울진 평해의 공보의 생활이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다.
 속초4.5℃
속초4.5℃ -1.4℃
-1.4℃ 철원0.2℃
철원0.2℃ 동두천0.6℃
동두천0.6℃ 파주0.2℃
파주0.2℃ 대관령1.0℃
대관령1.0℃ 춘천-0.8℃
춘천-0.8℃ 백령도4.8℃
백령도4.8℃ 북강릉9.0℃
북강릉9.0℃ 강릉9.8℃
강릉9.8℃ 동해9.7℃
동해9.7℃ 서울2.7℃
서울2.7℃ 인천2.5℃
인천2.5℃ 원주2.0℃
원주2.0℃ 울릉도9.8℃
울릉도9.8℃ 수원3.0℃
수원3.0℃ 영월0.8℃
영월0.8℃ 충주1.8℃
충주1.8℃ 서산3.3℃
서산3.3℃ 울진10.2℃
울진10.2℃ 청주2.7℃
청주2.7℃ 대전3.4℃
대전3.4℃ 추풍령1.7℃
추풍령1.7℃ 안동2.5℃
안동2.5℃ 상주1.0℃
상주1.0℃ 포항10.3℃
포항10.3℃ 군산5.4℃
군산5.4℃ 대구6.6℃
대구6.6℃ 전주8.9℃
전주8.9℃ 울산9.2℃
울산9.2℃ 창원8.3℃
창원8.3℃ 광주8.4℃
광주8.4℃ 부산11.3℃
부산11.3℃ 통영9.8℃
통영9.8℃ 목포10.4℃
목포10.4℃ 여수10.5℃
여수10.5℃ 흑산도11.5℃
흑산도11.5℃ 완도10.4℃
완도10.4℃ 고창9.4℃
고창9.4℃ 순천8.2℃
순천8.2℃ 홍성(예)2.7℃
홍성(예)2.7℃ 1.9℃
1.9℃ 제주15.4℃
제주15.4℃ 고산16.8℃
고산16.8℃ 성산15.0℃
성산15.0℃ 서귀포16.5℃
서귀포16.5℃ 진주6.8℃
진주6.8℃ 강화1.0℃
강화1.0℃ 양평1.8℃
양평1.8℃ 이천1.4℃
이천1.4℃ 인제-0.3℃
인제-0.3℃ 홍천0.3℃
홍천0.3℃ 태백6.1℃
태백6.1℃ 정선군1.4℃
정선군1.4℃ 제천1.0℃
제천1.0℃ 보은2.8℃
보은2.8℃ 천안3.0℃
천안3.0℃ 보령6.2℃
보령6.2℃ 부여2.9℃
부여2.9℃ 금산3.2℃
금산3.2℃ 2.9℃
2.9℃ 부안8.7℃
부안8.7℃ 임실6.2℃
임실6.2℃ 정읍9.1℃
정읍9.1℃ 남원6.1℃
남원6.1℃ 장수5.8℃
장수5.8℃ 고창군9.3℃
고창군9.3℃ 영광군8.8℃
영광군8.8℃ 김해시8.2℃
김해시8.2℃ 순창군5.9℃
순창군5.9℃ 북창원8.5℃
북창원8.5℃ 양산시9.9℃
양산시9.9℃ 보성군9.8℃
보성군9.8℃ 강진군10.4℃
강진군10.4℃ 장흥10.2℃
장흥10.2℃ 해남11.7℃
해남11.7℃ 고흥10.2℃
고흥10.2℃ 의령군5.6℃
의령군5.6℃ 함양군5.2℃
함양군5.2℃ 광양시9.6℃
광양시9.6℃ 진도군10.6℃
진도군10.6℃ 봉화2.7℃
봉화2.7℃ 영주2.5℃
영주2.5℃ 문경1.1℃
문경1.1℃ 청송군4.3℃
청송군4.3℃ 영덕9.2℃
영덕9.2℃ 의성3.9℃
의성3.9℃ 구미3.4℃
구미3.4℃ 영천6.7℃
영천6.7℃ 경주시8.0℃
경주시8.0℃ 거창6.0℃
거창6.0℃ 합천5.3℃
합천5.3℃ 밀양8.1℃
밀양8.1℃ 산청5.2℃
산청5.2℃ 거제9.3℃
거제9.3℃ 남해8.8℃
남해8.8℃ 8.6℃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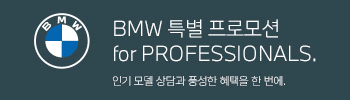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