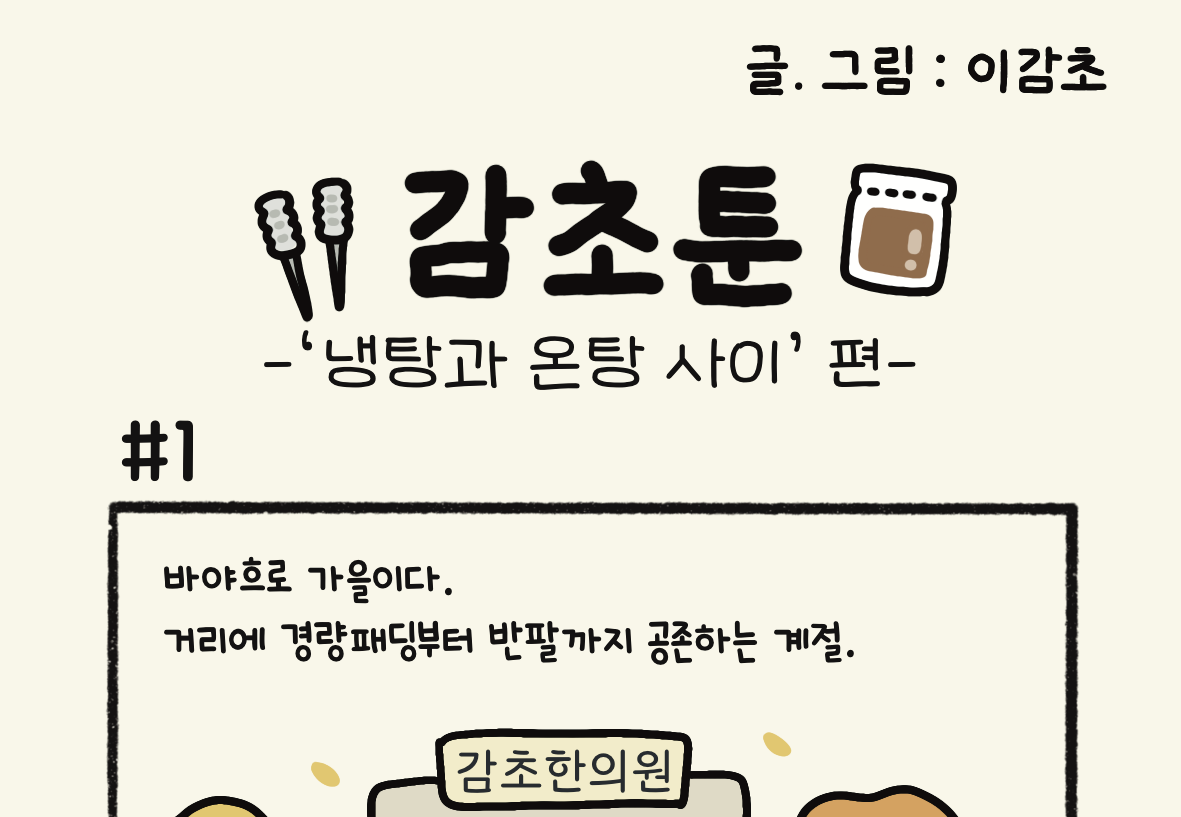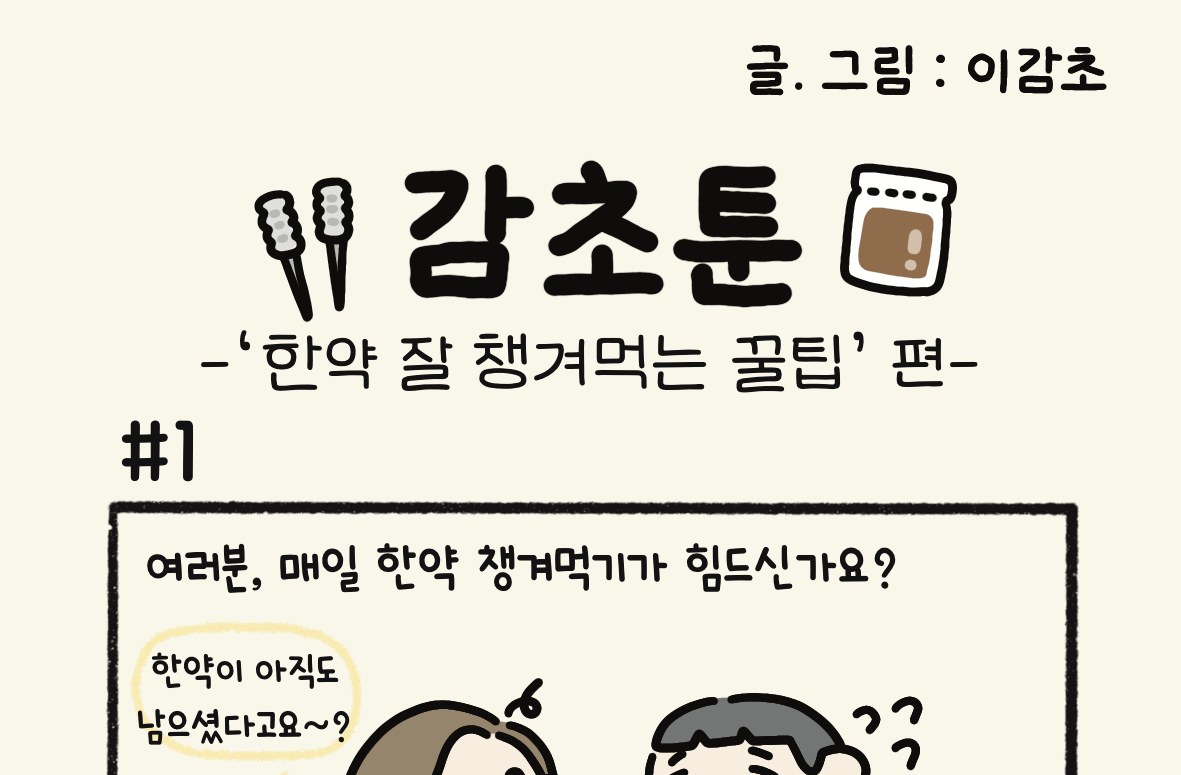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한의신문]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로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자가 무려 9만명에 육박하며, 그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 대응체계로는 가정형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생활권 기반의 조기 탐지·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15~’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만9,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정신건강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사회 구조적·정신건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NS 자극, 학업·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할 방어막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38.0%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친구와의 갈등(24.1%)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과 정서적 병리가 자살 시도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감지되는데, ’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정신건강 악화가 통계상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특히 응급실 내 자해·자살 시도자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바다(2.8%) 등 외부 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은폐된 위기’가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자살 시도 수단 중에서는 △약물 중독이 61.5%로, 가장 많았고 △관통상(21.9%) △추락·낙상(5.7%) △질식(5.4%) 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약물중독형 자해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관리 강화, 약국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자해·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됐다”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 경찰, 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로, 전국 23개 병원의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을 포괄하진 않지만, 손상 원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다.
 속초6.7℃
속초6.7℃ 1.0℃
1.0℃ 철원1.4℃
철원1.4℃ 동두천3.0℃
동두천3.0℃ 파주2.9℃
파주2.9℃ 대관령0.8℃
대관령0.8℃ 춘천1.9℃
춘천1.9℃ 백령도6.4℃
백령도6.4℃ 북강릉5.7℃
북강릉5.7℃ 강릉7.0℃
강릉7.0℃ 동해7.3℃
동해7.3℃ 서울5.0℃
서울5.0℃ 인천4.7℃
인천4.7℃ 원주3.0℃
원주3.0℃ 울릉도9.5℃
울릉도9.5℃ 수원5.1℃
수원5.1℃ 영월2.8℃
영월2.8℃ 충주4.5℃
충주4.5℃ 서산6.8℃
서산6.8℃ 울진7.5℃
울진7.5℃ 청주7.9℃
청주7.9℃ 대전6.6℃
대전6.6℃ 추풍령3.4℃
추풍령3.4℃ 안동3.3℃
안동3.3℃ 상주3.2℃
상주3.2℃ 포항8.3℃
포항8.3℃ 군산5.0℃
군산5.0℃ 대구5.8℃
대구5.8℃ 전주7.8℃
전주7.8℃ 울산8.0℃
울산8.0℃ 창원7.4℃
창원7.4℃ 광주8.0℃
광주8.0℃ 부산9.9℃
부산9.9℃ 통영8.1℃
통영8.1℃ 목포8.7℃
목포8.7℃ 여수9.1℃
여수9.1℃ 흑산도10.6℃
흑산도10.6℃ 완도6.6℃
완도6.6℃ 고창7.3℃
고창7.3℃ 순천5.1℃
순천5.1℃ 홍성(예)7.8℃
홍성(예)7.8℃ 5.8℃
5.8℃ 제주12.5℃
제주12.5℃ 고산15.7℃
고산15.7℃ 성산12.0℃
성산12.0℃ 서귀포12.9℃
서귀포12.9℃ 진주5.4℃
진주5.4℃ 강화3.7℃
강화3.7℃ 양평3.1℃
양평3.1℃ 이천3.0℃
이천3.0℃ 인제1.6℃
인제1.6℃ 홍천1.5℃
홍천1.5℃ 태백3.0℃
태백3.0℃ 정선군1.2℃
정선군1.2℃ 제천2.8℃
제천2.8℃ 보은3.3℃
보은3.3℃ 천안5.6℃
천안5.6℃ 보령6.6℃
보령6.6℃ 부여4.0℃
부여4.0℃ 금산6.0℃
금산6.0℃ 6.3℃
6.3℃ 부안7.4℃
부안7.4℃ 임실6.0℃
임실6.0℃ 정읍8.6℃
정읍8.6℃ 남원6.0℃
남원6.0℃ 장수7.0℃
장수7.0℃ 고창군7.6℃
고창군7.6℃ 영광군8.0℃
영광군8.0℃ 김해시6.7℃
김해시6.7℃ 순창군5.7℃
순창군5.7℃ 북창원8.0℃
북창원8.0℃ 양산시7.4℃
양산시7.4℃ 보성군6.7℃
보성군6.7℃ 강진군6.3℃
강진군6.3℃ 장흥5.8℃
장흥5.8℃ 해남7.1℃
해남7.1℃ 고흥6.5℃
고흥6.5℃ 의령군3.3℃
의령군3.3℃ 함양군4.9℃
함양군4.9℃ 광양시8.3℃
광양시8.3℃ 진도군7.1℃
진도군7.1℃ 봉화1.5℃
봉화1.5℃ 영주2.6℃
영주2.6℃ 문경2.8℃
문경2.8℃ 청송군2.0℃
청송군2.0℃ 영덕6.1℃
영덕6.1℃ 의성3.8℃
의성3.8℃ 구미4.4℃
구미4.4℃ 영천4.3℃
영천4.3℃ 경주시5.3℃
경주시5.3℃ 거창3.0℃
거창3.0℃ 합천5.5℃
합천5.5℃ 밀양4.6℃
밀양4.6℃ 산청5.0℃
산청5.0℃ 거제7.5℃
거제7.5℃ 남해7.6℃
남해7.6℃ 6.9℃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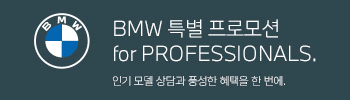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