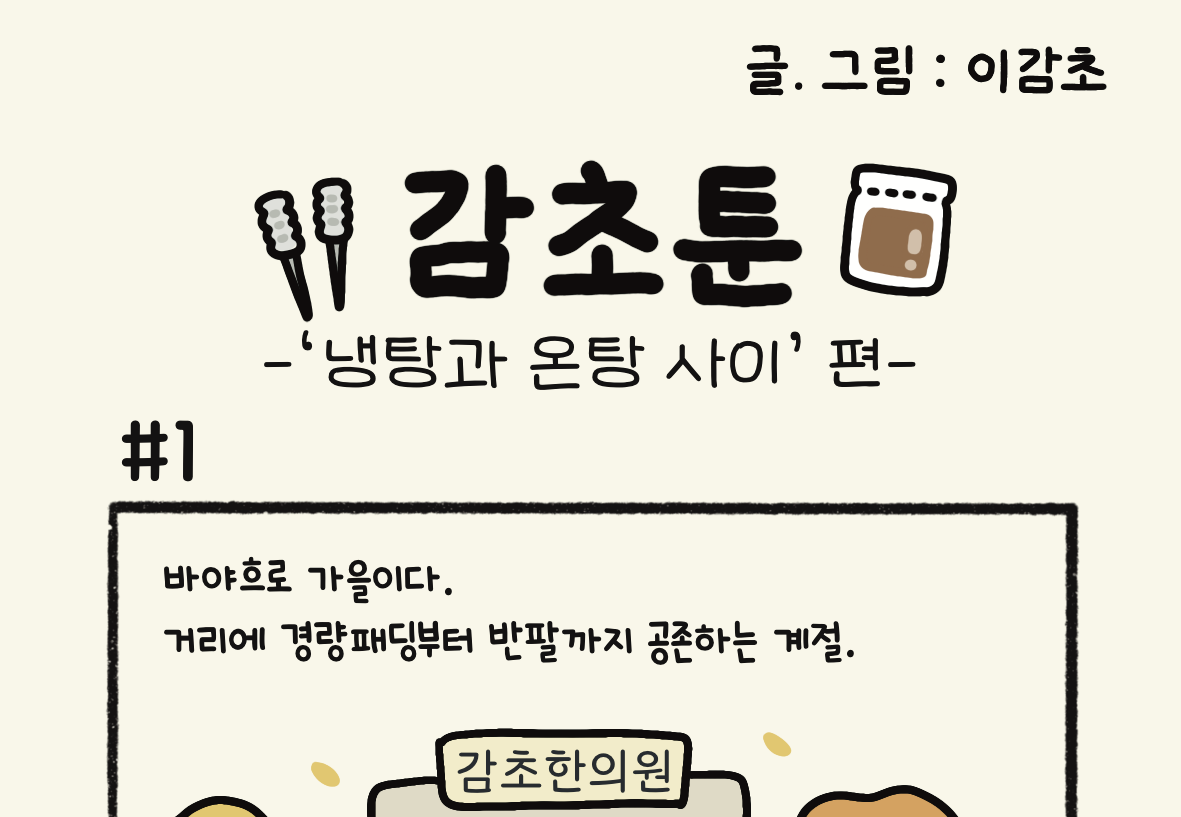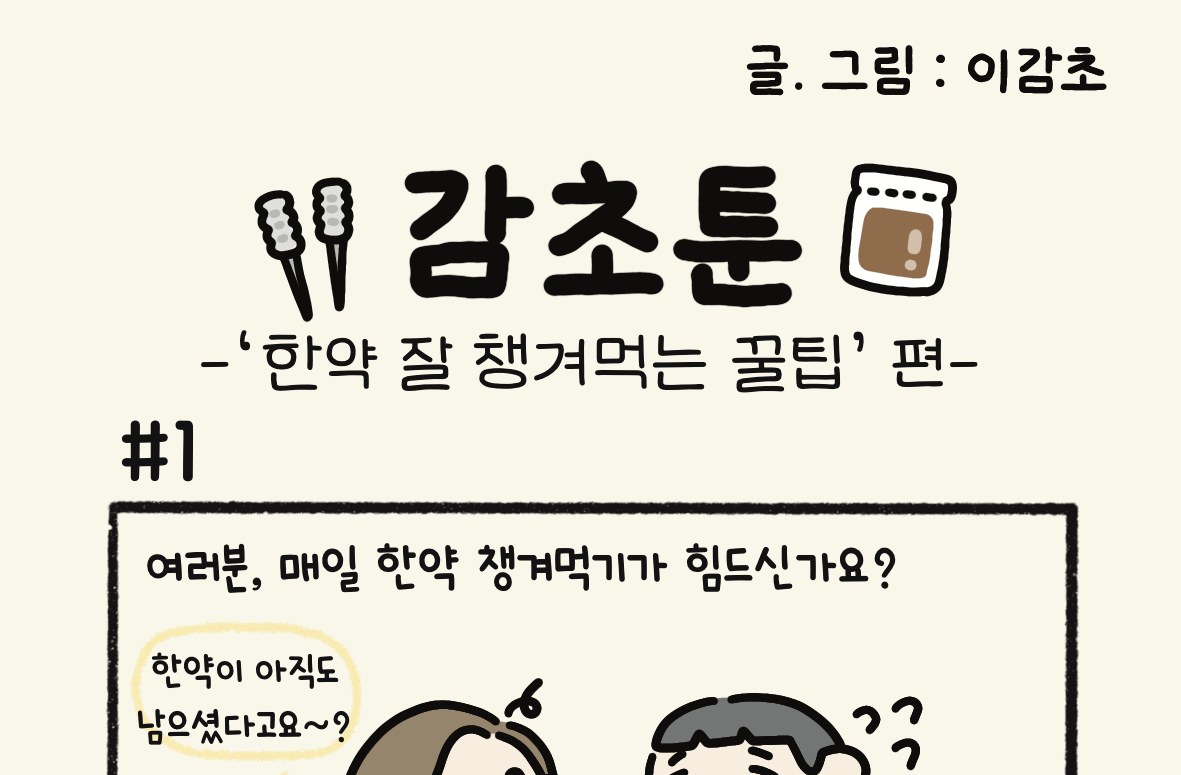제10회 경상북도 보건단체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8월 10일 오전 10시까지만 해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도저히 불가능 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위력이 약해진 덕분에 봉사단을 태운 여객기는 예정보다 6시간 늦게 캄보디아로 출발할 수 있었다. 태풍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었으나 기적처럼 가능해지면서 의료봉사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커졌다.
의료봉사단은 의사회 43명, 치과의사회 13명, 한의사회 8명, 간호사회 10명, 약사회 6명과 자원봉사자 등 총 90여명으로 꾸려졌다.
한의사회는 김현일 경북지부장님(김현일한의원)과 사모님, 이재덕 경북지부 명예회장님(천수한의원)과 아드님, 정병곤 경북지부 이사님(참신통한의원)과 사모님, 동국대 한창호 교수님(동국대 심계내과)과 필자를 포함한 총 8명이 참가했다.
봉사 첫날, 3시간 거리의 캄퐁톰으로 이동하면서 차장 밖으로 스치는 캄보디아의 풍경들은 마치 내 혈관 속에 카페인을 주입하듯 정신을 맑게 만들었다. 옛날 우리네 과거의 모습과 비슷한 시장과 풀을 뜯어먹는 비쩍 마른 소, 곡예하듯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 얼마 전에 비가 내렸는지 흙탕물이 가득한 개천들, 그 모두가 이색적 풍경으로 다가왔다.
이런저런 경치를 보면서 캄보디아에 오기 전 읽었던 ‘킬링필드’의 역사적 사건이 떠올랐다. 200만 명의 양민을 학살했던 민족이라는 생각이 드니 왠지 모를 무서움이 찾아 들었다.
선발대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오전 7시부터 500여명의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버스에 내려 봉사 장소에 들어서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천막 밑에 촘촘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첫날의 진료를 시작했다.
3개의 공간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됐고, 각 진료실에는 두 개의 진료 베드와 각각 하나씩의 책상과 의자가 구비됐다. 진료총괄을 맡은 김현일 회장님을 제외하더라도 4명의 의료진 수에 맞게 4개의 진료실이 필요할 것 같아 급하게 빈 공간 하나를 수소문해 진료실로 꾸몄다. 각 진료실에는 왕립프놈펜대학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통역봉사자들이 배치돼 환자들의 증상을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쫌부리 업 수어”, 공손히 인사
의사로 구성된 예진 팀이 한의과를 비롯해 안과,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치과 등에 환자를 배정하면, 각과에서 그들을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의료진이 처방하면 약사 팀에서 약을 조제했고, 임상병리 팀은 혈액검사까지 실시해 국내 종합병원을 캄보디아에 옮겨 논 것 같았다.
한의진료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분주해졌다.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은 우리와 다른 외국인의 모습이었고, 하얗게 막이 낀 눈동자들은 안과치료가 필요해 보였으며, 미소 띤 입술사이로 드러난 치아는 전문지식이 없는 필자의 눈에 조차도 치과치료를 한참 받아도 부족할 듯 보였다.
한의진료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어깨나 무릎,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고, 드물게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 환자들도 눈에 띄었다. 아침 일찍부터 기다린 환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증상 개선과 마음까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꼼꼼히 진료했다.

대기하고 있는 환자 행렬이 끝이 보이질 않았으며, 그들은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료실 베드가 부족한 탓에 무릎통증 환자는 앉아서 침을 맞도록 했다. 유침 시간동안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너무도 바빴던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 비로소 진료에 적응이 되는 듯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쫌부리 업 수어”라는 인사말을 하며 두 손을 합장하는 모습에 나 역시 똑같이 답을 했다. 진료를 마치고 나갈 때는 “쫌부리 업 리어”라며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응대하는 여유도 생겼다.
환자들의 맥을 짚고 설진을 하며 침을 놔 드리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그들이 정말 우리랑 많이 닮았다고 느꼈다. 필자가 진료하는 안동의 환자들 중 햇볕에 그을린 농부의 모습과 비슷했고, 맑은 표정과 순수한 미소는 어린 시절의 이웃 아주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더 많이 물어보고, 더 정성껏 진료했다. 첫날의 진료 인원은 122명이었다.
“위로받고 있다는 듯 밝은 미소 내보여”
8월 12일, 가장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 봉사 2일차다.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렸다. 어제 내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통증환자였다면, 오늘은 다양한 증상군의 환자들이 방문했다. 중풍후유증으로 인해 편마비가 온 환자가 있었고, 간질 발작을 주기적으로 앓는 환자도 있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았고, 소화가 안 돼 체해서 온 환자도 있었다.

진료가 마칠 때쯤이면 통역자원 봉사자와 안내를 도와주는 자원 봉사자들까지 한의치료가 신기해 보였는지 자기들도 진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그들에게 침 치료 및 추나요법을 해주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를 표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아껴가며 진료한 덕분에 286여명의 환자를 돌봤다.
8월 13일, 셋째 날이자 마지막 진료일이다. 오늘 역시 아침 일찍부터 많은 환자들이 몰렸다. 모두를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힘껏 파이팅을 외치며 진료를 시작했다.
3일째인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인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눌 수 있었고, 통역봉사자 없이도 대충 손짓발짓으로 어디가 아픈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첫날과 둘째 날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았는지 재진 환자들이 많았다.
맥을 짚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그 행위만으로도 그분들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며, 위로를 받고 있다는 듯 밝은 미소를 내 보였다. 또한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비롯 한방파스와 한방엑스제 처방 등 한의진료를 받은 그들은 무척이나 큰 행복을 느끼는 듯 보였으며, 그 모습을 보면서 필자 역시 큰 보람을 느꼈다.
‘킬링필드’라는 슬픈 역사로 상처받은 이들
의료봉사에 참여치 않았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이들에게 적지 않은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킬링필드’로 연상되던 무서운 캄보디아인들이 아닌 ‘킬링필드’라는 슬픈 역사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이 행하는 하나하나의 몸짓과 선한 눈빛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3일,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그들이야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진료가 익숙해지다 보니 오전에만 112명을 진료했다. 슬슬 짐을 싸야할 시간이 다가 왔다.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치고 다른 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자니 잠시만 서 있어도 뜨거운 열기가 온 몸을 휘감았다. 운 좋게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봉사를 했으나 예진 팀과 다른 몇몇 팀들은 한증막 같은 무더위 속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힘들게 봉사했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봉사를 오기 전부터 근무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원팀’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머나먼 이국땅 캄보디아에서 성심을 다해 진료하다 보니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정성껏 진료했던가?’ ‘매너리즘에 빠져 대충대충 진료하진 않았던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는데, 편한 상황의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가?’ 여러 생각들이 뇌리에서 맴돌았다.
이제껏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반복된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캄보디아에서 봉사를 해보니 지금껏 어떻게 살아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한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번에 봉사를 함께 다녀온 한 선배님이 말씀이 떠올랐다. “캄보디아에 봉사를 올 때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치료해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매번 나 자신도 치유했던 것 같아.”
 속초5.0℃
속초5.0℃ 0.2℃
0.2℃ 철원0.0℃
철원0.0℃ 동두천0.2℃
동두천0.2℃ 파주-1.3℃
파주-1.3℃ 대관령0.0℃
대관령0.0℃ 춘천1.0℃
춘천1.0℃ 백령도2.4℃
백령도2.4℃ 북강릉6.1℃
북강릉6.1℃ 강릉7.0℃
강릉7.0℃ 동해7.3℃
동해7.3℃ 서울2.2℃
서울2.2℃ 인천1.0℃
인천1.0℃ 원주2.3℃
원주2.3℃ 울릉도7.8℃
울릉도7.8℃ 수원1.9℃
수원1.9℃ 영월2.9℃
영월2.9℃ 충주2.4℃
충주2.4℃ 서산1.1℃
서산1.1℃ 울진7.9℃
울진7.9℃ 청주3.5℃
청주3.5℃ 대전1.5℃
대전1.5℃ 추풍령1.2℃
추풍령1.2℃ 안동3.2℃
안동3.2℃ 상주2.5℃
상주2.5℃ 포항8.5℃
포항8.5℃ 군산2.7℃
군산2.7℃ 대구5.9℃
대구5.9℃ 전주3.0℃
전주3.0℃ 울산7.5℃
울산7.5℃ 창원7.8℃
창원7.8℃ 광주3.6℃
광주3.6℃ 부산8.7℃
부산8.7℃ 통영8.5℃
통영8.5℃ 목포4.8℃
목포4.8℃ 여수6.7℃
여수6.7℃ 흑산도6.3℃
흑산도6.3℃ 완도4.8℃
완도4.8℃ 고창3.2℃
고창3.2℃ 순천3.1℃
순천3.1℃ 홍성(예)2.3℃
홍성(예)2.3℃ 1.4℃
1.4℃ 제주8.3℃
제주8.3℃ 고산8.3℃
고산8.3℃ 성산7.9℃
성산7.9℃ 서귀포12.6℃
서귀포12.6℃ 진주7.1℃
진주7.1℃ 강화-0.2℃
강화-0.2℃ 양평0.9℃
양평0.9℃ 이천1.3℃
이천1.3℃ 인제0.5℃
인제0.5℃ 홍천1.0℃
홍천1.0℃ 태백2.4℃
태백2.4℃ 정선군2.7℃
정선군2.7℃ 제천1.6℃
제천1.6℃ 보은1.7℃
보은1.7℃ 천안1.7℃
천안1.7℃ 보령2.3℃
보령2.3℃ 부여1.9℃
부여1.9℃ 금산2.3℃
금산2.3℃ 1.9℃
1.9℃ 부안3.8℃
부안3.8℃ 임실2.8℃
임실2.8℃ 정읍3.2℃
정읍3.2℃ 남원3.2℃
남원3.2℃ 장수1.3℃
장수1.3℃ 고창군3.7℃
고창군3.7℃ 영광군3.7℃
영광군3.7℃ 김해시7.0℃
김해시7.0℃ 순창군3.3℃
순창군3.3℃ 북창원7.7℃
북창원7.7℃ 양산시9.2℃
양산시9.2℃ 보성군5.4℃
보성군5.4℃ 강진군4.7℃
강진군4.7℃ 장흥4.5℃
장흥4.5℃ 해남4.4℃
해남4.4℃ 고흥4.6℃
고흥4.6℃ 의령군5.6℃
의령군5.6℃ 함양군4.9℃
함양군4.9℃ 광양시6.3℃
광양시6.3℃ 진도군5.5℃
진도군5.5℃ 봉화2.3℃
봉화2.3℃ 영주3.4℃
영주3.4℃ 문경2.3℃
문경2.3℃ 청송군4.9℃
청송군4.9℃ 영덕7.4℃
영덕7.4℃ 의성4.7℃
의성4.7℃ 구미3.4℃
구미3.4℃ 영천5.4℃
영천5.4℃ 경주시6.9℃
경주시6.9℃ 거창3.7℃
거창3.7℃ 합천5.8℃
합천5.8℃ 밀양8.1℃
밀양8.1℃ 산청5.6℃
산청5.6℃ 거제8.3℃
거제8.3℃ 남해8.8℃
남해8.8℃ 8.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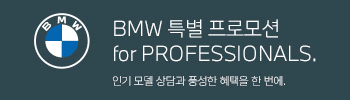









![[자막뉴스]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건강 증진에 한 몫](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gWjQvmYX_208ec3d22cca3c4dabe0690736cb02fecca2d1b0.jpg)
![[자막뉴스] 국회와 정부, K-MEDI 동행 선언](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pWMfBulG_1f19604ef50b802d08e2eba88760392f36a0c023.jpg)
![[자막뉴스] '2025 한의혜민대상'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대상](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9aoWOQ7J_f562bba0ac6cd1fa3cb3e0cfa693448832494455.jpg)
![[자막뉴스]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https://akomnews.com/data/photo/2512/990852453_KopJVa4A_3c6f4bbb06b1e87364c53423365ed86fb200850b.jpg)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https://akomnews.com/data/photo/2507/2039300137_tzacLJfB_2f59361a10063749b72d0e25ccb1a8ab9fe13f47.jpg)